[중부시론] 한병선 문학박사·교육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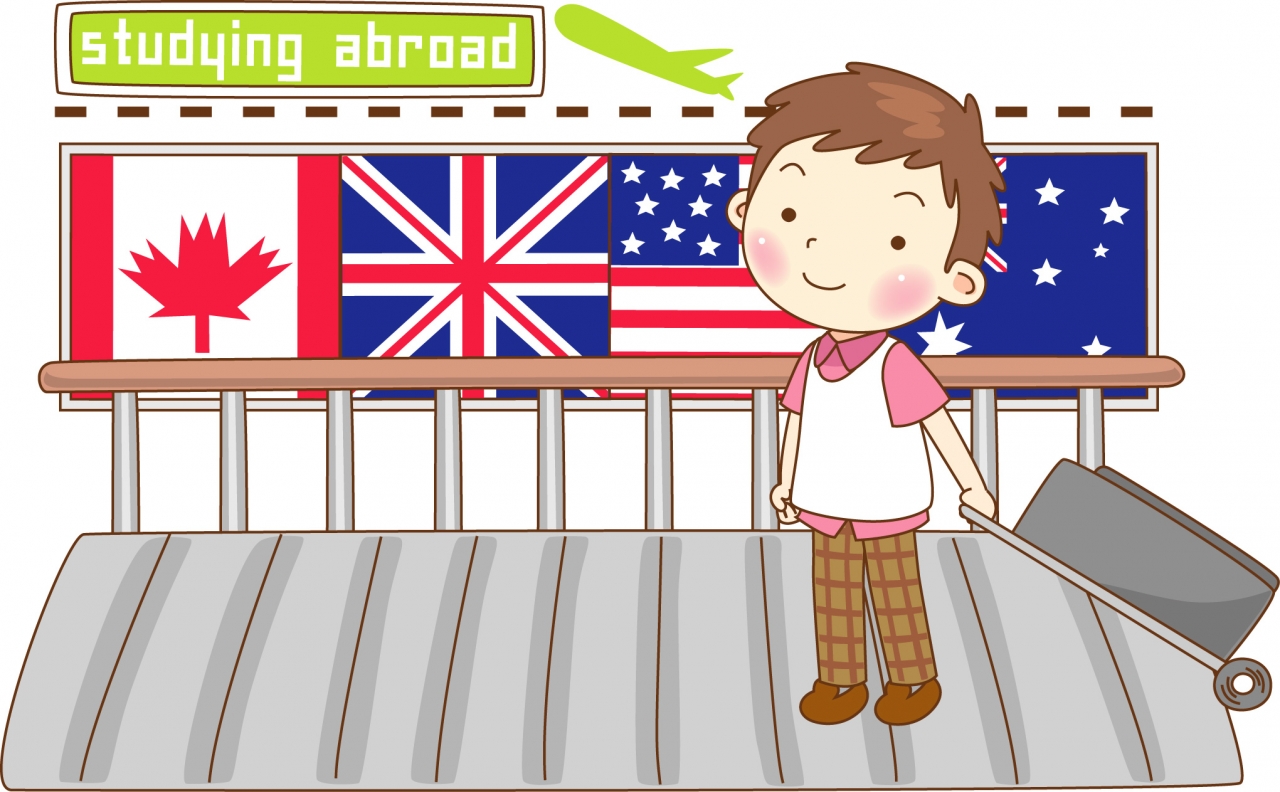
최근 "달라진 해외 유학 트렌드, 꼭 필요한 학생만 가는 추세, 공대 유학생들은 현지 취업이 목표"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과거의 '묻지마' 유학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았던 2000년도를 전후한 묻지마 유학은 조기유학이 대세를 이루었다. 2010년도에는 32만9천579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이런 추세는 여전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외교부가 발표한 '2017년 재외동포 현황'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유학중인 학생수는 26만284명으로 2014년(27만6천834명)보다 1만6천550명이 줄었다.
이런 현상은 유학 후 취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뿐만 아니라, 조기유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 등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조기유학이 가장 활발했던 2006년 당시의 유학 실패율이 70%에 이른다는 경험적 보고도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바뀐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유학에서도 실리를 좇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과 중국을 선택했지만 현재는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금융업 등 현지 취업이 잘되는 홍콩이나 중동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뉴욕대(NYU) 아부다비 캠퍼스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들 지역으로 쉽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대학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한 결과다.
2000년대 이전의 고전적 복고풍 유학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내에서 일단 대학을 마치고 더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는 케이스다. 이런 패턴은 조기유학 열풍이 일었던 이전의 전형적인 유학패턴으로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유학이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조기유학이 도피성 유학으로 인식되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 결과 조기유학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온 탓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만의 경우는 아니다. 일본도 70년대에 조기유학이 유행했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심한 입시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내에서 검증받은 후 유학을 가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주요 일간지들의 조기유학 분석기사에서도 이런 시각은 잘 나타난다. 인지도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이나 경제력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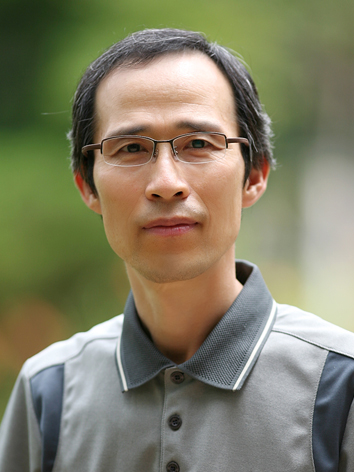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 학문이나 기술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유학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다.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신라의 최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유학생이었다. 그는 당시 최고 수준의 당나라 학문을 배우기 위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홀로 유학길에 올랐다. 귀국 후 유불선(儒彿仙) 사상을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 장영실도 명나라 유학파다. 세종은 명나라의 최첨단 천문기술과 역법을 배워오도록 1421년 장영실, 최천구, 윤사웅을 명나라로 유학을 보냈다. 그 결과가 물시계와 해시계, 측우기 등의 제작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이제 2000년도 초반과 같은 '묻지마' 유학패턴을 벗어나 최치원과 장영실이 그랬듯 '선별적 실효성' 유학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무조건 유학을 보내고 보자는 비합리성보다 합리적 판단과 필요를 생각하는 쪽으로 의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