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요즘 봄기운이 완연하다. 마침 외출을 했다가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한참을 걷는데 교복을 입은 남학생 세 명이 마주 걸어왔다. 아마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듯 했다. 세 명 다 키가 작고 교복은 몸에 비해 살짝 커 보였다. 한눈에 봐도 이번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같았다. 새 교복, 새 가방, 새 신발 등 모두 새 것이었다.
나는 예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새 책상을 갖고 싶었다. 당시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함께 쓰는 책상이 있기는 했다. 앉은뱅이 책상이었는데 주로 서랍엔 아버지의 연장들이 들어있고 많이 낡았다.
우리 집은 작은 방이 두 개로 벽 사이에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방이 작다 보니 윗방에 책상을 놓았고 책을 빼 안방에서 숙제를 하곤 했다. 주로 밥상에서 숙제를 했던 기억이 더 많다. 아니면 배를 쭉 깔고 방바닥에서 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나만의 책상을 갖고 싶었다. 책상 위에서 라디오도 듣고 책도 보고 싶었다. 가끔은 이런저런 상상도 하고 책상에 딸린 서랍에 비밀 일기장도 편지도 넣고 싶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책상은 갖지 못했다.
스무살 넘어 한 소설가의 물푸레나무로 만든 책상 이야기를 읽은 후 그 책상이 갖고 싶었다. 물푸레나무도 모르면서 그냥 오래 쓸 수 있다는 단단한 책상이 갖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안 아내가 어디서 깔끔한 상판 하나를 얻어왔다. 다리로 쓸 봉도 네 개 구해와 책상을 만들었다. 좀 어설퍼도 나만의 책상에 감동을 듬뿍 먹었다. 책상은 방도 작은데 기어코 방에 들여와 창을 열면 감나무가 보이는 곳에 놓았다.
그날부터 책상을 닦기도 하고 예쁜 꽃 화분도 놓았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도 몇 권 옆에다 놓고, 보기만 해도 책이 잘 읽어질 것 같았고 글도 술술 잘 써질 것 같았다. 며칠은 늦게까지 책상에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창밖의 감나무도 감상했다.
그러나 얼마 후 책이 점점 쌓여가고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많아지더니 끝내 먼지가 뽀얗게 앉기까지 했다. 아내는 이런 내게 불만이 늘어났다. 그러는 아내에게 방이 좁아서 그렇다며 말을 흐렸다.
겨울이 오면서 춥다는 이유로 책상은커녕 이불을 돌돌 말고 벽에 기대보곤 했다. 책상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아내와 난 책상을 분해해 테라스에 갖다 놓았다. 필요하면 다시 만들기로 하고. 책상을 치우니 방이 훤해졌다. 작았던 방을 차지했던 책상이 사라지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꼭 책상이 필요하면 예전처럼 식탁을 사용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괜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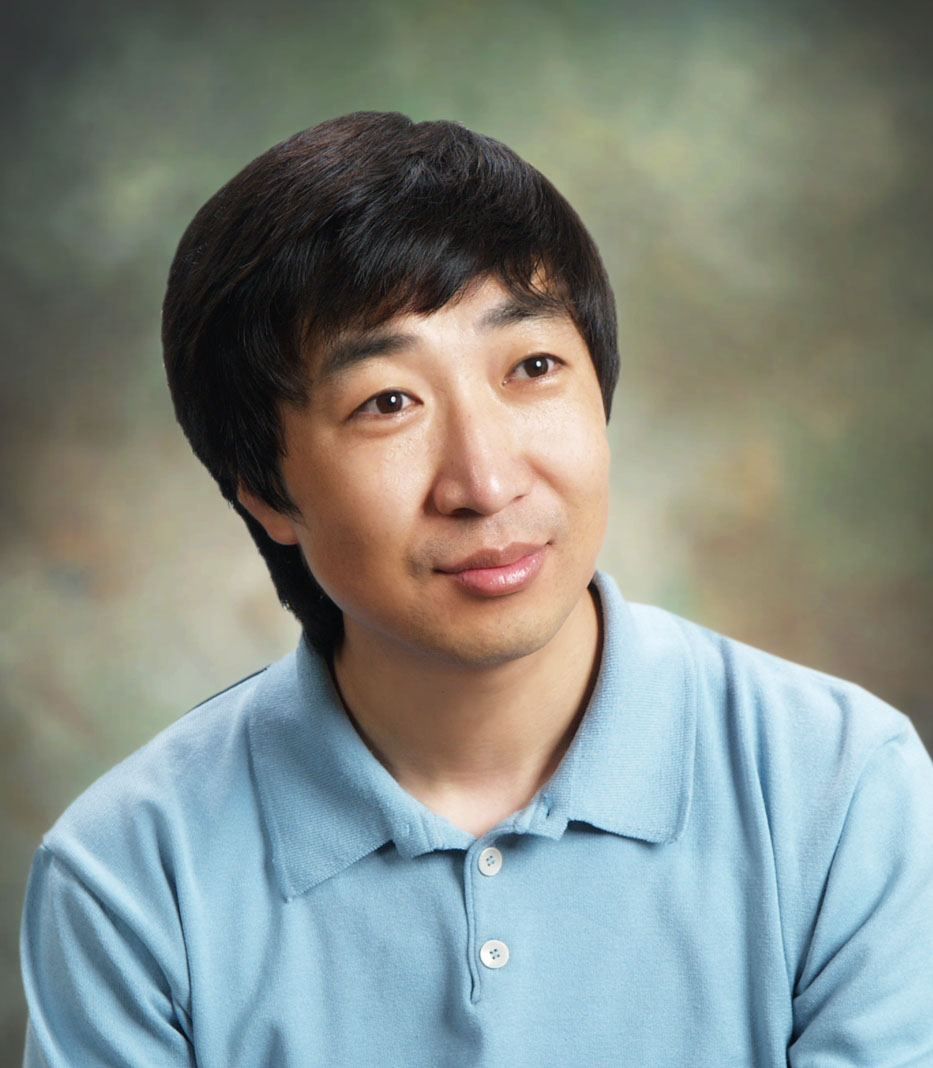
그러다 며칠 전 잡지에 나온 책상을 보고 눈길이 멈췄다. 스웨덴 가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말름스텐의 책상 때문이었다. 이 책상이 나온 지 80년이 흘렀다고 한다. 지금도 대를 이어 책상을 만든단다.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책상은 내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비슷했다. 저러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었다.
요즘은 책상도 참 다양하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나온 한 책상은 사려고 해도 조금 기다려야할 정도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책상을 만들어 자녀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테라스에 있는 책상을 조만간 방으로 들여와야겠다. 이번엔 과연 나만의 책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