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요즘 연일 덥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땀으로 흥건할 정도다. 하루에 샤워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날은 씻고 시원한 과일을 먹으면 그만이다. 그중 수박이 최고다.
며칠 전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수박 얘기가 나왔다. 학교를 오고 가다 화분에 심은 수박 싹이 잘 크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덩굴이 화분 밖으로 나와 구슬만 했던 수박이 점점 자라는 게 신기했다. 아이들이 물도 주고 신경을 많이 쓰는 지 수박 몸집이 제법 커졌다.
여름방학 동안 돌볼 사람이 없어 방학 직전 수확(?)을 했다고 한다. 더러는 집에 가지고 가서 기르기로 하고. 정말 수박을 먹었는지가 궁금했다. 보통 수박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맛있게 먹었단다. 빨갛게 잘 익고 아주 달았단다. 아마도 직접 기른 수박이라 더 달지 않았을까 싶다.
수박은 커서 좋다. 가족끼리 빙 둘러 앉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가격 또한 비싸지 않아 한여름 누구든지 즐겨 먹을 수 있다.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여름의 대표적인 제철 과일은 수박이 아닐까 싶다. 어릴 적에는 냉장고가 없어 우물에 수박을 담가 놓았다가 건져 먹기도 했다. 아버지가 노끈 망에 담아 온 수박은 저녁 먹고 먹을 생각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시원했다.
수박의 겉모습은 좀 투박하게 생겼다. 꼭지에 불을 붙이면 슝~ 날아가 터질 것 같은 폭탄 같다. 겉모습만 보면 맛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자르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빨갛게 익은 속살에 까만 씨, 한 입 베어 물면 부드러운 달콤함에 빠져든다. 잘려진 수박의 빨강과 초록, 까만 씨는 보기만 해도 달콤함과 시원함을 단박에 느낀다.
어릴 적에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수박씨를 먹으면 뱃속에서 수박덩굴이 자라 왕수박이 달린다'는 말에 씨를 골라내느라 힘들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친구들이랑 입안에 수박씨를 모아 후두두둑 총알을 날려 얼굴에 점 붙이기 놀이를 했다. 그러다 수박씨에 영양가가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다음부터 수박씨를 와작와작 깨물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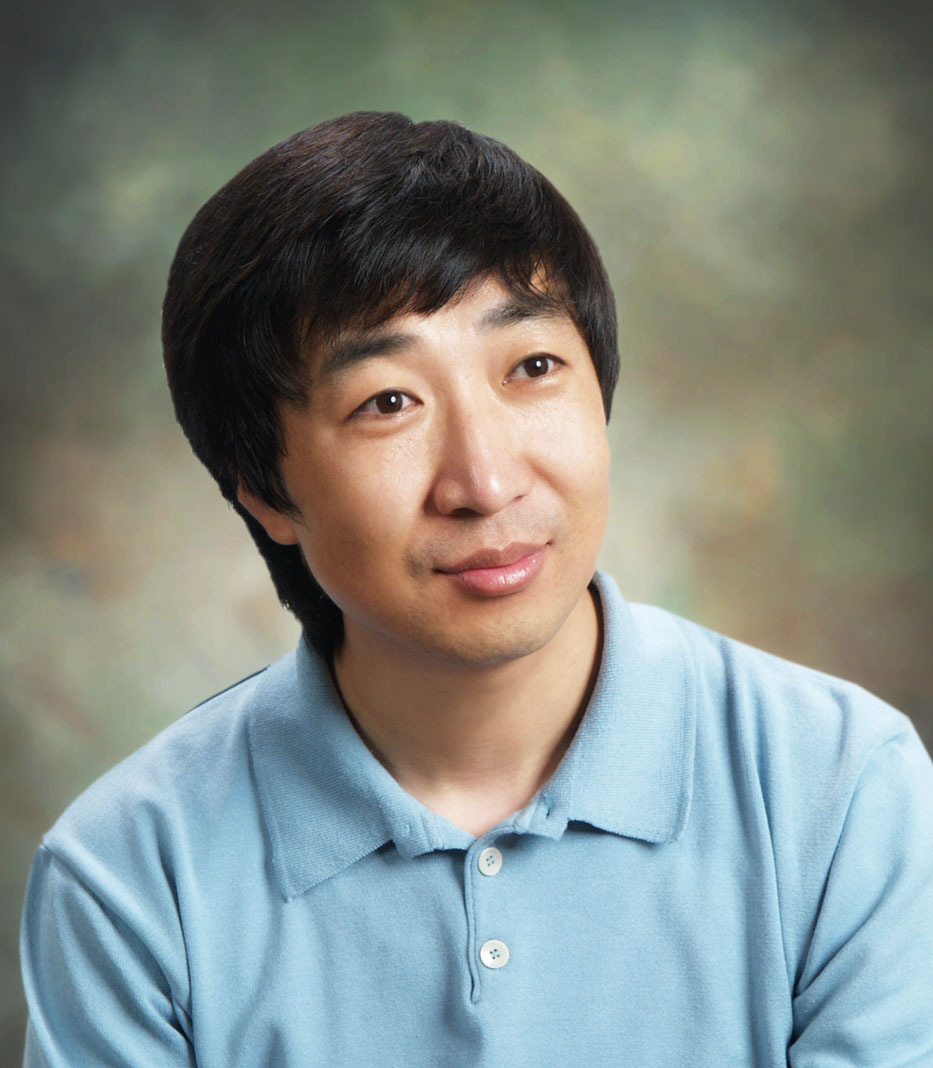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엄청 부러워할 일이 있다. 바로 수박 값이다. 지금 대중적인 과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수박 한 통 훔쳤다고 곤장을 100대 맞고 멀리 귀양까지 보냈다고 한다. 당시 수박 한 통 값은 쌀 다섯 말 즉 반 가마 값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귀하다 보니 수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수박껍질은 나물로도,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했다. 중국은 호박처럼 수박껍질 탕도 끓여 먹었는데 여름 더위를 식히는데 최고라고 한다. 미국도 수박나물을 먹고 수박껍질로 피클을 담근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본초강목'에 수박껍질은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한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귀한 과일임에 틀림없다.
요즘 웬만한 대가족이 아니면 수박 한 통을 다 먹기는 힘들다. 그러다 보니 반은 먹고 반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럴 때 보통 랩에 씌워 보관하는데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우리 지역 가까운 음성 맹동이 수박의 고장이다. '다올찬 수박'으로도 유명한 맹동 수박을 찾아 먹어야겠다. 아주 더운 날, 오래 전 '금박'같은 느낌으로 감사하게 먹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