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코로나19로 하루를 열고 닫는 요즘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곤 한다. 며칠 전 무심코 작년 파를 심었던 작은 상자를 보았다. 초록 파가 뾰족 새싹처럼 올라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앵두나무 아래 상사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 한 뼘 정도나 수북이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여러 가지 덤불과 나뭇가지가 있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한쪽으로 꺾인 듯 올라왔다. 잘 올라올 수 있게 얼른 치워줬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덤불과 나뭇가지로 인해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이런 것만 그런 건 아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것이다. 막 뛰어 다닐 아이들은 더 할 것 같다.
봄 하면 겨울동안 움츠려 있던 몸이 자연스럽게 밖을 찾게 된다. 초봄이 다소 쌀쌀해도 그 쌀쌀함이 묻어 있는 바람이 좋다. 그 쌀쌀함에 봄이 주는 시작이란 설렘과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난 겨울에도 웬만해선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 예전 자전거 통학을 할 때도 답답해서 하지 않았다. 입이 얼어 얼얼한 정도였지만 답답함이 싫었고 찬 기운에 깊게 호흡하는 그 숨이 나름 좋았다.
하지만 요즘은 마스크를 하는 게 기본이 되었다. 혹여 깜빡 잊고 잠깐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한 겨울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가실 때 마스크를 쓰고 가셨다. 집에 와서는 제일 먼저 벽에 걸어두신 마스크.
한번은 옆집 누나가 뜨개질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만들고 싶은 게 있었다. 그건 바로 마스크였다. 누나의 친절한 지도(?)로 내 첫 작품 마스크가 탄생했다. 실이 없어 누나가 준 실로 만든 고동색의 마스크였다.
얼마나 촘촘하게 뜨개질을 했는지 마스크를 하면 숨이 탁탁 막혔다. 그래도 내가 만든 첫 마스크여서 그해 겨울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 후로 마스크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 마스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른 벗게 된다. 길을 가다가 약국 앞을 지날 때면 길게 선줄을 보면 뉴스에서 본 장면이 실감난다. 마스크가 아니라 금스크란 이름이 붙여질 정도다.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외출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모처럼 중앙탑을 찾았다. 작년에도 중앙탑에 간 적이 있지만 볼일만 보고 금방 오곤 해서 자세히 못 보았다. 중앙탑에서 최근 끝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작년 '복수가 돌아왔다'도 촬영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생각보다 사람이 꽤 많았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작은 텐트까지 갖고 왔다.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마스크를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연둣빛 물오른 나무들도 오리들도 산수유꽃도 봄숨을 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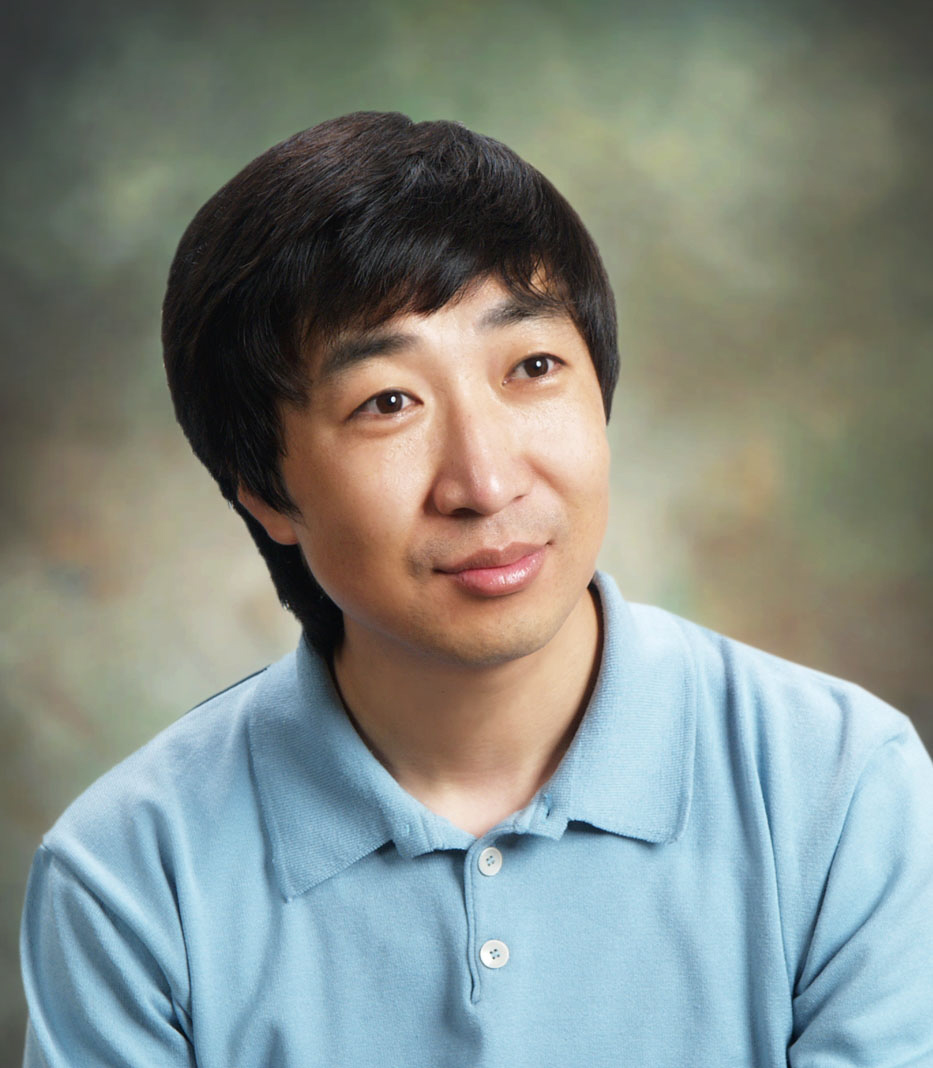
귀 기울이면 강물 흐르는 소리에도 강물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지금은 다들 힘들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마음도 보태주는 연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소식들도 접한다. 이때 나는 또 삶의 숨을 깊게 쉬곤 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의 뿌리도 더 깊고 멀리 견고하게 뻗어 나갈 것이다. 비록 지금 봄 다운 숨은 제대로 쉴 수는 없지만, 대신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뜨거운 삶의 숨을 쉬니 그 어떤 숨에 비교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