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트로트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언제부턴가 가수 이름과 노래제목을 거꾸로 알기도 하고 가수와 배우도 헷갈렸다. 한번은 그룹 이름이 과자이름인줄 알고 큭, 헛웃음이 나왔다. 나름 나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자체가 나이 듦의 신호였다.
요즘 나오는 노래는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가수가 누구인지 모르니 느낌이 덜하다.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 내가 즐겨보는 프로는 '가요무대'란 것이다. 나도 예전에 가요무대를 누가 보나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습다. 그 누가 바로 내가 되었으니 말이다.
내가 좋아했던 가수나 노래가 나오면 '저렇게 모습이 변했구나' 라며 노래를 감상한다. 왠지 편안해지고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마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난 것 같다. 그 당시 풍경들과 친구들의 모습도 하나하나 떠오른다. 이런 내가 아내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나보다. 하지만 아내도 곧 나처럼 될 확률이 높다.
한때 나는 노래방 단골손님이었다. 그때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트로트 몇 곡이 있었다. 예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는 자주 노래가 흘러 나왔다. 전축이 귀하던 시절이라 어쩜 아버지는 소리를 더 크게 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레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다.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 배호의 안녕, 백남숙의 꽃잎 편지 등 노래를 불렀다. 눈물 젖은 두만강, 번지 없는 주막, 찔레꽃, 봄날은 간다, 알뜰한 당신 등 같은 노래도 끝까지 부를 수 있었다. 다른 것은 잘 까먹는데 노래가사는 잘도 외웠다. 지금도 줄줄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이런 노래들이 요즘 텔레비전에 종종 나온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다. 채널마다 다양하다. 거의 가수 수준에 넋이 빠질 정도다. 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이면 나름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내가 후한 점수를 준 참가자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이해가 안 돼 답답하다. 그러면서 버럭 심사위원을 탓하기 일쑤다.
결혼 후 노래방을 가지 않는다.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정도다. 예전 생각이 나서 트로트를 부르면 잘 나왔던 점수도 참 짜게 나온다. 요즘은 다들 가수다. 어찌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입이 쩍 벌어진다.
한때 나도 가수해도 되겠단 말을 들었다. 서울의 노래자랑에 참가하려고도 했는데…, 이젠 말짱 꽝이다. 그래도 내가 줄기차게 부르는 이유는 노래 속에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듯싶다.
요즘에는 젊은 트로트 가수도 많다. 한 곡 잘 배워 부를 기회가 되면 한번 멋들어지게 뽑아야겠다. 그럼 점점 흐려질 듯한 지금의 나와 풍경들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 싶다.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은 어땠는지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눈앞에 슬슬 그림처럼 그려진다. 노래는 그런 매력과 힘을 가진 것 같다.
트로트 중에서 가사가 좋은 곡이 참 많다. 정말 시 같은 노래도 있다. 나도 중학교 때부터 노랫말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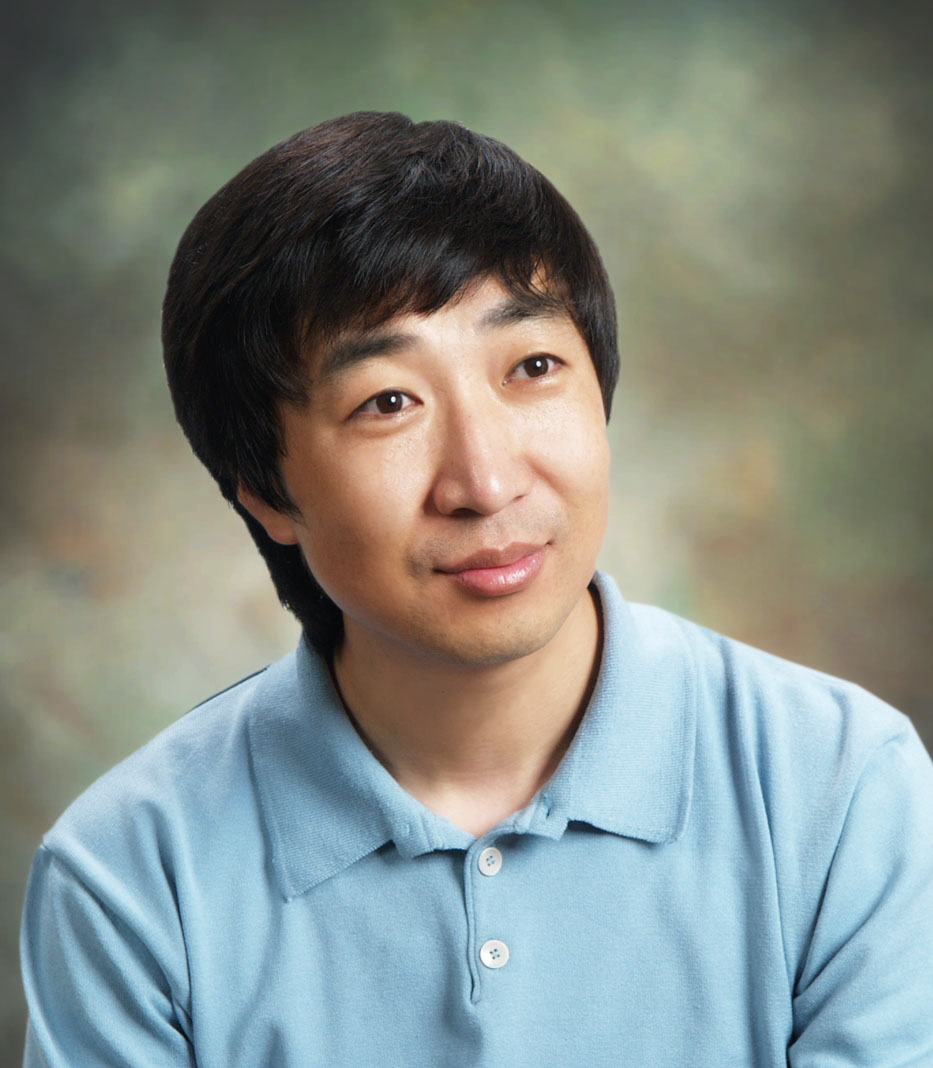
고등학교 때에는 트로트 노랫말을 썼다. 지금은 동요 노랫말도 쓰고 여전히 트로트 노랫말도 쓰고 있다. 이왕이면 내가 쓴 노랫말에 곡을 붙여 진하게 부르는 날도 꿈꾸어 본다.
무엇보다 요즘 다들 힘든데 흥얼흥얼 트로트로나마 잠시 쉼이 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