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18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내와 함께 집 구조며 창문 모양 등에 참여해 작은 집이지만 애정이 남달랐다.
우리가 꾸민 집에 살면서 둘째가 생겼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작은 방 하나와 테라스, 계단을 만들었다. 할 수 없이 잘 자라던 감나무 가지 한 쪽을 잘라내야 했다. 다른 나무는 옮기거나 뽑아내야 했다.
그 자리가 조금 허전해 보였는지 지인이 아주 작은 뽕나무를 화분에 심어주었다. 그런데 키가 너무 빨리 자라 집 외벽 옆에 옮겨 심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뽕나무와 덩굴장미 아래서 커피도 마셨다. 하지만 얼마 후 아쉽게도 덩굴장미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덩굴장미가 사라지니 담장 겸 하얀 외벽이 썰렁해 보였다. 빛도 많이 바래 보기가 좀 그랬다. 그 순간 담쟁이덩굴이 생각났다. 그래서 작은 담쟁이덩굴을 구해 심었지만 죽거나 마음처럼 쑥쑥 자라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담쟁이덩굴을 심었다. 다행히 담쟁이덩굴 옆 뽕나무가 쭉쭉 자라 보랏빛 오디를 따 먹으면서 담쟁이덩굴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어느 순간 뽕나무 뒤 벽을 타고 담쟁이 초록덩굴이 쓱쓱 뻗어가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뻗어 나가는데 대단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더니 이젠 집을 반 넘게 덮어버렸다. 어떻게 잘 아는지 창은 빼놓고 그 테두리로 덩굴을 뻗었다. 멀리서 보면 초록페인트를 칠한 것 같다. 오래되어 외벽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빗물에 얼룩덜룩 보기 흉한 곳도 있지만 초록으로 완벽하다.
올해 어쩌면 페인트칠을 할 기회가 있었다. 아내는 잘 됐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생각이 많아졌다. 한참 잘 자라고 있는 초록 담쟁이덩굴을 떼어내는 것이 어쩐지 미안했다. 아내에게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반반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다. 나는 그냥 안 칠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외출을 하면서 초록으로 점점 번지는 담쟁이덩굴이 불쌍했다. 하루아침에 뜯길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페인트칠 기회는 사라졌다. 아내와 난 더 잘 됐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한심하다고 한숨을 내쉴 것이다.
그날 이후 담쟁이덩굴에게 더 쭉쭉 뻗어서 우리 집을 온통 감싸달라고, 숨겨달라고 속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벽으로 안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는 덩굴을 살짝 잡아 위로 방향을 틀어 준다. 내 마음을 안 것인지 요즘엔 벽에 착 붙어 초록 손을 잽싸게 뻗어 올라간다.
낡은 벽이나 담 틈새에 반짝이는 눈부신 담쟁이덩굴. 빗방울이 하나 둘 닿으면 살짝 리듬을 타며 춤을 추는 담쟁이덩굴이 대견스러워 죽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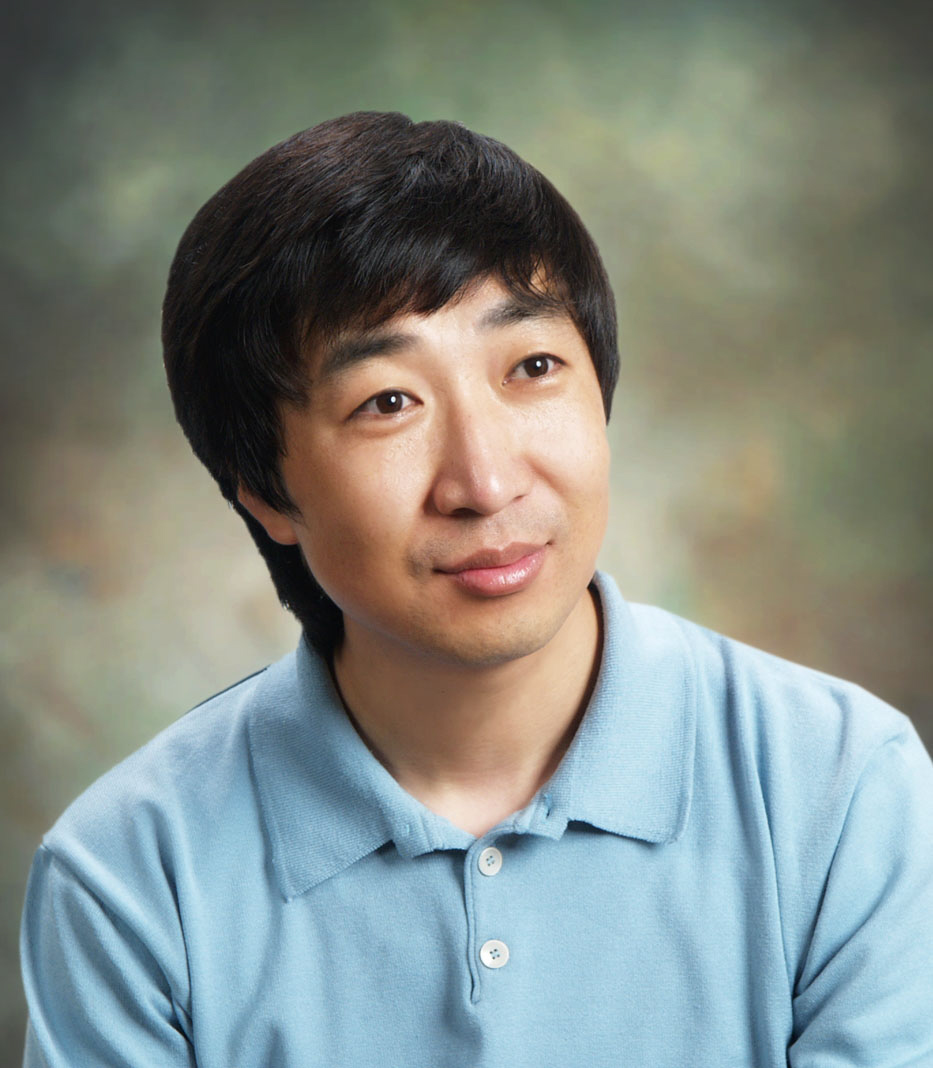
담쟁이덩굴은 가을이 오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물이 든다. 그 모습 또한 참 아름답다. 살짝 아침 안개가 낀 날 뿌리 쪽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붉은 잎들은 꽤 운치 있다. 그때마다 휴대폰에 담쟁이덩굴을 찰칵, 여러 장 담아 둔다.
무엇보다 담쟁이덩굴의 줄기를 꺾어 씹어 보면 단맛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설탕이 없던 오래 전에는 담쟁이덩굴을 진하게 달여 감미료로 썼다고 한다. 줄기와 열매를 그늘에서 말려 달여서 복용하면 당뇨병의 혈당치를 떨어뜨린다고도 한다. 정말 신통방통하다.
아, 앞으로 페인트칠 할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해도 안하기로 결정했다. 아내와 나는 담쟁이덩굴이 만들어준 초록 궁에서 왕자와 공주처럼 오래오래 살기로 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