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 사람] 김정호 청주랜드 진료사육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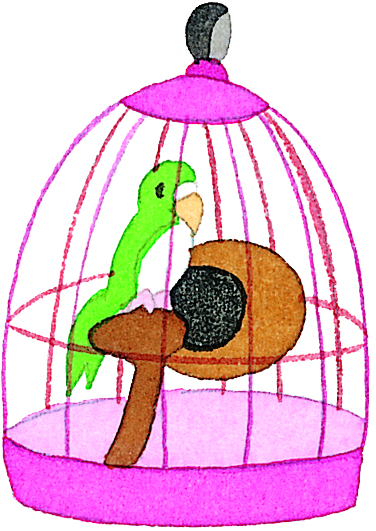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서울의 어느 작은 서점 앞이었다. 전화번호만 건네받고 만날 장소에서 기다렸다.
아내는 약속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약속시간이 한시간쯤 지났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우두커니 기다리기도 그래서 서점에 들어가 책을 한 권 샀다. 다행이 책이 재미있었고 한참을 읽었을 때 아내가 나타났다. 아내는 아버지 친구분이 억지로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기 싫어 일부러 나오지 않았고 혹시나해서 지나는 길에 들려본 것이었다. 약속시간을 두시간이나 기다린 나를 아내는 미안해하면서 신기해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를 보기 위해 경기도 일산에 자주 갔지만 아내가 쉬는 날 내려와 청주에서도 만났다. 아내를 만나고 있었던 그날 동물원에는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새로 구입한 사랑새(budgerigar) 100여마리를 야외 새장에 들여왔다. 당시 동물 먹이주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전국의 동물원들은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체험장을 만들었다.
아내와 청주시내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내리는 가을비에 인도블록이 젖고 있었고, 오늘 들여온 사랑새가 걱정됐다. 사랑새들은 동물원에 오기 전에 분명 관상조류를 판매하는 실내시설에 있었을텐데, 야외새장에서 찬 가을비를 맞으면 모두 저체온으로 폐사할 수 있었다. 아내를 차에 태우고 농사용 자재를 파는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를 둘러보다가 비닐하우스에 씌우는 큰 비닐을 발견했고, 이 큰 비닐을 야외새장의 지붕에 덮으면 사랑새들이 비는 안맞겠다 싶었다. 큰 비닐을 접어넣은 상자는 꽤나 무거웠다. 상자를 메고 동물원 정문에 도착하자 밤 10시가 됐다. 동물원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랑새들은 횃대에 일렬로 앉아 처음 맞는 비를 어쩔수 없이 감당하고 있었다. 아내와 비닐을 꺼내자 가로 10m, 길이는 다 펼칠 수 없는 큰 비닐이어서 적당히 잘랐다. 그러나 새장 지붕에 비닐을 씌우는데 문제가 있었다. 야외새장은 높이가 7m 정도로 끝이 피뢰침이 솟아 있었고 지붕은 망으로 돼 있어 사다리를 사용해서 밟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높은 새장지붕에 비닐을 씌울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다. 불현 듯 동물원 관리사무실옆에 대나무숲이 생각났고, 톱을 가지고 가서 가장 키가 큰 대나무 두 개를 잘랐다. 두 개의 대나무를 비닐 앞쪽에 꽂고 연처럼 날려 새장을 덮으려는 계획이었다. 마침 비바람은 거셌고 대나무의 한쪽은 내가, 다른 한쪽은 아내에게 들게했다. 두 대나무를 높이 들자 비바람 속에 비닐이 날았다. 높은 새장을 덮으려할 때 힘에 부친 아내는 번번히 대나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내는 어떻게든 버텨보려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입술이 파래진 아내는 빗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몸은 비에 젖고 쓰러지는 대나무를 감당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하다 우리는 결국 새장지붕을 다 덮지는 못했지만 반쯤을 덮었다. 다음날 사랑새들은 절반이 덮힌 비닐 아래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아내의 손은 따뜻했고 우리는 말없이 오래 걸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랑새들은 그 후 10년 동안 동물원을 찾는 아이들의 먹이주기 체험에 쓰여졌다. 아이들은 사랑새가 날아와 손바닥에 앉아 모이를 먹는 이 체험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 체험은 사랑새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랑새가 손바닥의 먹이를 먹기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용기로 가능해진다. 더욱이 사랑새가 빨리 내려앉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효과적인 체험을 위해선 사랑새들이 체험 전까지 굶어야 했다. 체험은 아이들이 주는 먹이로 배를 채우는 20분이면 끝이 났다. 동물의 긴 배고픔을 이용한 짧고 말초적인 즐거움이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4년 전부터 사랑새 체험을 중단했다. 동물의 복지문제도 있었지만 동물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새가 가지고 있는 인수공통질병이 아이들에게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행한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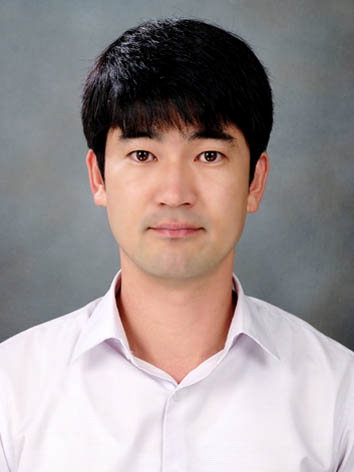
얼마 전 담당사육사가 사랑새장에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넣어줬다. 떨어진 나무들을 치워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사랑새의 장난감을 넣어준 것이다. 사랑새는 하루종일 가지를 오르내리며 나뭇잎을 따고 논다. 자연스러운 새의 움직임에 사람들의 시선이 오래 머문다. 사랑새장을 지날때면 즐거운 새소리에 머리가 맑아진다. 그날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울던 20대의 아내가 생각난다. 사느라고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잡고 새소리를 들으러 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