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얼마 전이었다. 저물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집 앞으로 119 구급차가 지나갔다. 우리 동네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119 구급차가 지나가면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친구와 함께 들어왔다.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가득한 얼굴이다. 아내와 난 아이들 곁으로 다가 앉았다.
둘은 새로 생긴 골목길로 집에 오는 중이었다고 한다. 우리 집 근처에 주차장이 생기고 그 사이로 막혔던 골목길이 큰 길과 이어졌다. 나 역시 그 길이 우리 집으로 오는 지름길이라 오가곤 했다. 중간쯤 왔을 때였다고 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귀 기울여들었더니 할머니의 목소리였다고 한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키가 큰 아들은 까치발로 담 안을 들여다보았단다. 한 할머니가 마당 한쪽 세탁실 문턱에 걸려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와 대화를 통해 손을 길게 뻗어 대문 안쪽에서 어떻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단다. 할머니가 몸을 일으켜 달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움직이면 더 아프고 위험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 사이 할머니가 불러준 전화번호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없는 전화번호였다고 한다. 할 수 없이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전화를 갖다 드렸단다. 통화가 된 할머니는 넘어져 다쳤다고 전했단다.
잠시 후 119 구급차가 와서 간신히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두 아이들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듬뿍 해 주었다. 아내와 나는 우리 동네는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계시니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몇 년 전 한겨울 마감 원고가 있어 늦게까지 글을 쓰고 있을 때였다. 그날따라 엄청 추웠다. 한 새벽 2시가 넘었을까. 누군가 출입구 문을 두드렸다. 맨 처음에는 그냥 바람소리에 문이 흔들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계세요. 안에 누구 있어요?"
얼른 나가 보니 우리 집 근처에 사는 할머니였다. 얇은 옷을 대충 입고 오들오들 떨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가 쓰레기가 버리고 싶었단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바람에 철문이 홱, 닫혔던 것이다. 열쇠도 없는데.
그러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 우리 집 불빛이 보여 문을 흔든 것이다. 나는 얼른 할머니 집으로 가서 위층에 사는 가족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의자를 가지고 갔다. 담이 높아 다시 옆집 담으로 갔다. 바짝 의자를 놓고 올라가 할머니 집 담으로 와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 시간 많이 춥고 놀란 눈치다.
집으로 돌아오니 긴장이 풀린 탓인지 나또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 이후 할머니는 나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구마며 사과 등을 주시고 간다. 이젠 괜찮다 해도 멈추지를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문이 흔들리거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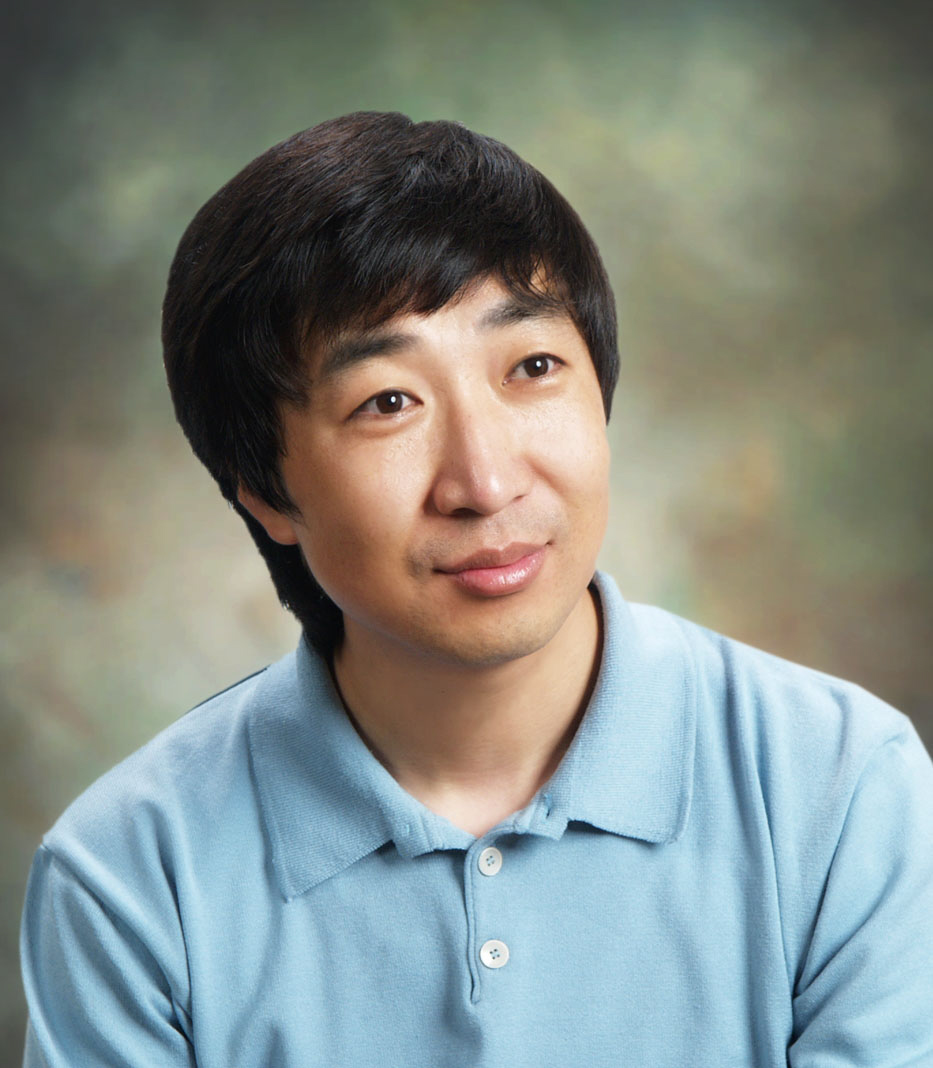
점점 추워진다. 우리 주변에 작은 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싶다. 뉴스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 소식을 접하며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요즘 춥고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좀 더 따듯한 관심으로 훈훈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