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일 칼럼] 최동일 논설실장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위정자를 뽑는 숱한 선거가 있었지만 누구를 고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선거는 처음인 것이다. 이른바 비호감 선거이다. 그런데 그 선거가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다. 국정을 책임지고 니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 선거다. 그 만큼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마지못해, 솎아내는 식으로 치러야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이 아닌 이른바 제3지대는 존재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선거라는 것이 결국 지지율 싸움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면 이기는 구조다. 그것도 단 한명만 선택을 받게 되면 싸움이 치열해지게 된다. 사실 선거가 아니어도 세상살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게 어디 있겠는가. 그 정도와 대상이 다를 뿐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며 선택받기 위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자칫 경쟁이 너무 과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 무겁다 보니 이를 차지하기 위한 열기는 그 무엇보다 뜨겁다. 경우에 따라 법망을 피하거나, 체면불구 몰염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쩌다 한번이어야 한다. 이런 일이 거듭되고 수시로 벌어지면 선택의 장이 엉망이 된다. 대상을 평가하거나 살펴보기에 앞서 드러난 것이 사실인지, 보여지는 것이 진실인지 가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런 일은 정당의 몫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차적인 검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단계를 거친 대상이라면 그 실체가 분명해야 한다. 만약 이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스스로 선택 받을 수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내가 안될 것 같으니 판을 안갯속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꼭 일어나기 마련인가 보다. 주요 정당들의 당내 경선이 우려의 그림자에 뒤덮이더니 이어진 본선에서도 그 그림자는 여전하다. 후보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은 삶의 궤적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후보가 됐다는 그 자체로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자신을 더 드러내 새로운 지지층을 넓히기 보다는 지금의 지지층을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인 듯 싶다. 그러나 청와대 주인이 되는 길이 그렇게 간단할 리 없다. 그동안 묻히고 감춰졌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편가르기에 가려졌던 진실들이다.
뒤늦게 터져나오는 실체들로 인해 대선판은 난장판이나 다름없게 됐다. 후보 본인도 있지만 가족들도 빠지지 않는다. 아예 후보의 가족대 가족으로 의혹열전이 벌어질 정도다. 상대를 향한 의혹털기 속에 뒤로 밀렸던 후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공약이나 비전, 자질도 문제가 됐다. 상대 흠집내기 차원을 넘어서는 의혹과 지적이 계속되자 후보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워낙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보니 '송구하다'는 사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말 그대로 '송구(悚懼) 선거', '사과 대선(大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재집권을 향한 여당과 정권을 되찾으려는 제1야당에 집중된다. 월등히 앞서는 당 지지도와 그동안 진보·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선판을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한 판에서 이들의 뜻과 다른 국민들의 생각이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잠시 주목을 받는 듯 하다가도 언제 그랬는가 싶게 사라져버리기 일쑤다. 오로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듯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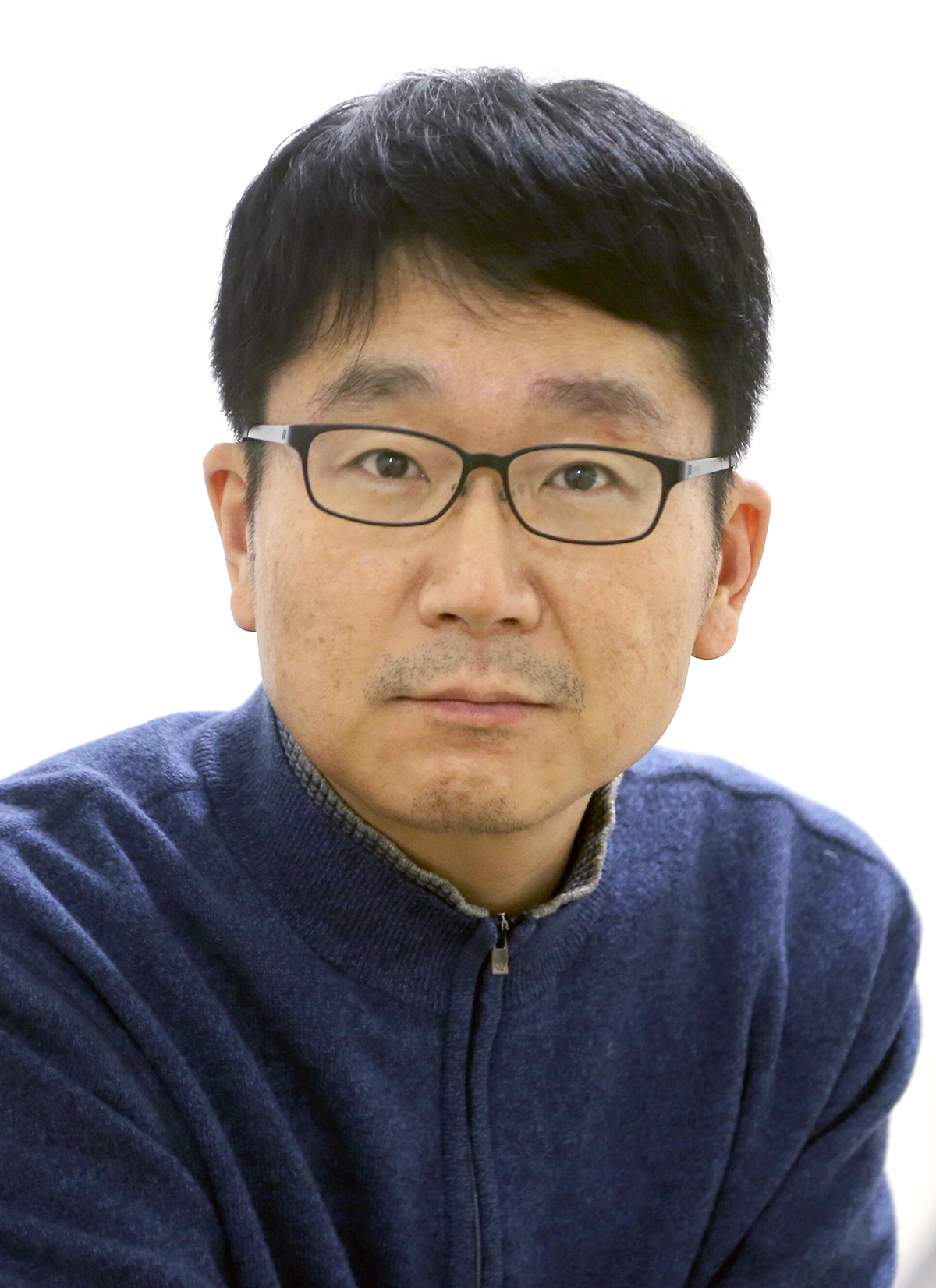
말바꾸기가 끊이지 않는 신뢰부족 후보와 국정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자질부족 후보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못해 선택한 후보와 함께하는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아닌 후보는 아닌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선거혁명이다.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면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가슴속의 선거혁명을 끄집어내야 한다. 선거혁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선거혁명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