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눈] 문상오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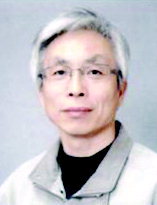
저녁 종합뉴스에 7천만 원이 첫머리를 장식한 적이 있었다.
복권당첨금이 아니었다. 선량한 시민의 복지성금도 아니었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링을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회사 평균연봉이 그 정도라는 거였다.
그러면서 그 부품업체 노조에 대해 비판하기를,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회사의 불법파업을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인터뷰를 실었다. 지식경제부 장관의 말이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만한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정도를 받자면, 경력 30년쯤 된 사람이 연장근무에 특근까지 '만땅'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근로환경은 더 열악해서, 주야 2교대로 돌아가는데 야간근무를 할 때면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해야 한단다.
이 같은 사실관계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인터뷰는 가치판단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7천만 원씩이나 되는 고액 연봉을 받아선 안 된다.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파업 같은 걸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나 내겐 그렇게 들렸다.
과연 그럴까. 노동자들은, 날품팔이 육체노동자들은 7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 안 되는 걸까.
또한 일정선의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떠한 근로환경에 처해서도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돼지꼬리가 돼지를 흔들 듯, 일부 사업장의 차질로 해서 전체 공정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그 꼬리를 잘라내서라도 일부사업장의 파업을 봉쇄해야 할까.
스스로의 꼬리를 자를 줄 아는 재주를 가진 건 도마뱀뿐이다.
당장은 현명하게 보일지 모르나 평생 땅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 천형에 묶여 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시대이다. 사회는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직업과 직종은 더욱 다양화되고 분기(分岐)되어 헤아릴 수조차 없다.
1인 사업장이라 해서 자신이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일 년 내내 기계장치만 돌아가는 무인 사업장도 있다.
골프채 몇번 휘두르고는 몇십 억을 받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래머는 이상한 부호 몇개 고치는 걸로 일과를 때우기도 한다.
그들이 쌓은 스펙과 스킬은 무시하고 그들의 봉급이 과하다고만 할 것인가.
물론 노동운동에도 문제는 있다.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고 외친 마르크스가 죽은 지도 120여년이 넘었다.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던 공산혁명의 자취도 사라진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그 사상과, 그 당시의 그 투쟁방법으로 노동운동에 임하고 있다. 변화에 둔감한 공룡처럼, 아니면 시대상황을 읽어내지 못하는 돈키호테처럼 앞으로만 내달리려고 한다.
언제까지 '철의 노동자'의 굴레에 갇혀있을 것인가. 또 언제까지 확성기와 붉은 깃발로 도심 한가운데를 활보할 것인가. 현장이 변한 만큼 투쟁수단도 바뀌어야 한다.
신분이 직업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전문화된 '꾼'이 신분의 얼개를 이루는 수평적 사회로 변했다.
계급이 사라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모호하다. 우리가 아닌 그 모두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분쟁의 선결과제는 이해를 앞세운 신뢰이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야 백번을 타협해본들 다시 또 백번을 타협해야 하는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남들이 잘되는 꼴도 좀 봐가며, 열린 마음으로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노사공영의 상생의 길이 모색 되어질 것이다.
중부매일
jb@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