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요즘 여름방학이 한창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한 휴가 등으로 하루가 짧을 것이다. 그 휴가를 마치고 나면 시간은 훌쩍 가고 곧 개학이 기다린다. 이때 조금씩 생기는 고민, 바로 방학과제다. 요즘 과제는 별로 없는 듯싶지만 더러 일기나 독후감 쓰기 등을 볼 수 있다. 예전 몰아 쓰던 일기는 정말 괴로웠다. 왜 그렇게 과제가 많던지... 하지만 5학년 때부턴가 방학과제를 잘 해오면 분야별로 상장을 주었다. 지금이야 대회도 많고 상 받을 기회도 많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 가을 미술대회나 웅변대회... 별로 기억이 없다.
늘 방학과제를 별로 못해가던 그래서 괴롭던 내가 5학년부터는 착실한(?) 학생이 되었다. 바로 상장 하나 때문이다. 5학년 여름방학식날 태어나서 처음 상장을 받았다.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맨 마지막인 입선을 받았다. 상장에 아주 작은 배지를 상품(?)으로 주었다. 상장에 선명하게 적힌 내 이름 석 자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겨우 벌렁 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에 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당시 꽤 먼 과수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었다. 과수원 주인은 따로 있고 부모님이 한 해만 맡아 농사를 짓는 것이라 아버지는 늘 복숭아밭에 붙어 사셨다.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가는 곳의 과수원. 하지만 나는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몇 번을 오갔을 정도다. 과수원은 2차선 도로를 계속 가다보면 한 초등학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쉬웠다.
난 태어나서 처음 받은 상장을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복숭아과수원을 찾아 나선 것이다. 훅훅 더운 바람에 땀이 났지만 정말 힘든 줄 몰랐다. 붕붕, 발걸음이 가볍고 꼭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복숭아를 따고 있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난 상장을 보여드렸다. 부모님이 복사꽃처럼 활짝 웃으셨다.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더 상장을 받고 싶었다. 그 해 여름방학 과제를 몽땅 해갔다. 그림은 보통 8절지에 그렸다. 하지만 난 큰 도화지를 서로 붙여 함석대문에 빨래집게로 고정시킨 뒤 숲속 풍경을 그렸다. 나름 물감으로 어른 흉내를 내면서. 개학 후 복도마다 그 반에서 잘한 방학과제를 전시하고 각 과제별로 학년에서 제일 잘 한 학생 한 명을 특선, 그리고 나머지 각 반에서 한 명씩 가작이란 상을 주었다. 그런 학생의 과제물에 빨간색과 노란색 쪽지를 달아 놓았다. 난 특선을 받지는 못했지만 네 개의 상장을 하루에 받았다. 이번에도 심장이 밖으로 튀어 나올 것 같았고 숨을 잘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안방 벽에 내 상장을 담은 액자를 걸어 주셨다. 그날 이후 공부도 잘 못하고 재주도 없던 나는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고 글도 썼다. 6학년 여름방학에는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선명하다. 함석 대문을 이젤 삼아 종이를 달고 붓 끝에 흐르는 수채화의 물맛을 황홀하게 맛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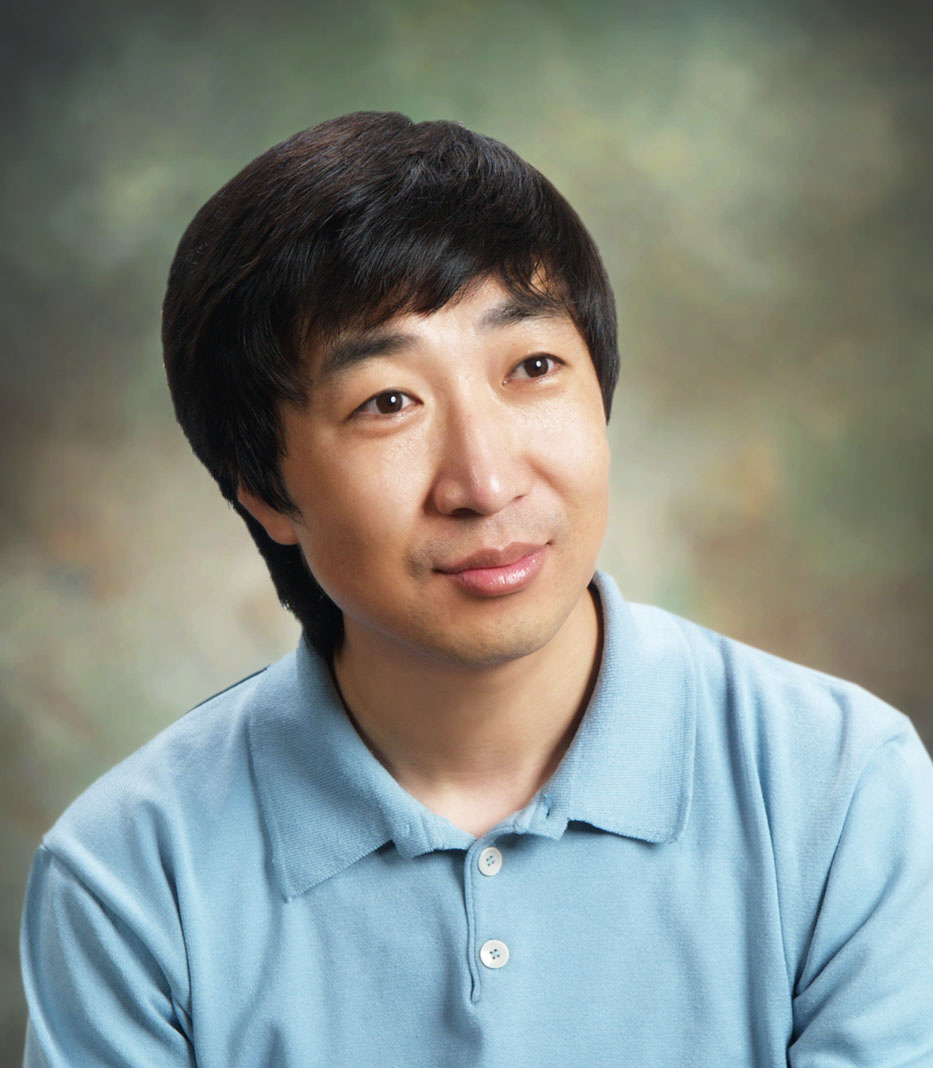
지금도 갖고 있는 첫 상장과 한꺼번에 받은 네 개의 빛바랜 상장들. 그 상장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그 상장으로 인하여 콩알만큼도 못하던 자신감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키도 제일 작던 나, 땅만 보고 걸었을 정도로 내성적인 내가 중학교에 가서는 전교생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소풍을 가면 앞장서 춤도 추어댔다.
정말 상장의 힘은 대단했다. 또 앞으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에게서 착한 아들상, 정다운 아빠상, 참 좋은 남편상을 ... 오늘 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콩국수가 놓여 진 소박한 '밥상'도 받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