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몇 년 전부터 하루를 자고 오는 여행은 없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면서 집과 일터를 오고가고만 했다. 잠깐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쉼이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발이 꽁꽁 묶였다.
그래도 시간은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중에 누군가 페이스북에 올린 노란 유채꽃 사진을 봤다. 한참을 눈 맞춤했다.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작은 밭 한쪽에 핀 유채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얼마나 색이 환하고 예쁜지 손으로 살짝 쓰다듬곤 했다.
어릴 적 난 유채꽃이 조금씩 모여 피는 줄 알았다. 그러다 한참 후 제주도의 유채꽃 풍경을 달력으로 봤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 때문이었다. 그때부터였던 거 같다. 꼭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 가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제주도 갈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 갔을 적에는 다른 계절이어서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 며칠 전 잠시 시간이 생겨 페이스북에 올라온 유채꽃을 만나러 갔다. 바로 우리 지역 엄정면 목계나루 인근이었다. 몇 년 전에도 목계나루에 가면 유채꽃이 있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언제 피고 언제쯤 지는 줄 잘 몰랐다. 한번은 마음먹고 가려고 하니 이미 다 꽃이 졌다고 했다. 그러다 또 잊고 살았다.
목계나루 유채꽃밭에 도착하니 입이 쩍 벌어졌다. 멀리서만 봤는데도 온통 노랑으로 황홀했다. 내가 사는 근처에 이렇게 넓은 유채꽃밭이 있는 줄 몰랐다. 내 몸이 온통 노랑으로 물들 것 같았다.
유채꽃을 향하여 돌다리를 밟고 작은 시냇물을 건넜다. 돌다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마법의 징검돌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눈앞에 가까이 펼쳐진 유채꽃. 늦은 오후였지만 노란 유채꽃은 더 눈부셨다. 평일이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선지 사람도 몇 명뿐 ... 유채꽃 속에 사람들은 작은 점처럼 보였다. 유채꽃 옆으로 맑게 흘러가는 강물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꼭 명화 속에 내가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유채꽃 옆으로 난 길은 흙길이었다. 오래 전 버스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폴폴 나던 그런 길. 아니면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는 정겨운 신작로 같았다. 한참 가다보니 원두막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원두막이었다. 어릴 적에는 원두막에서 복숭아도 먹고 잠도 자곤 했다.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리면 손과 발을 밖으로 뻗었다. 그럼 비가 닿아 간질간질했다.
슬쩍 원두막 사다리를 타고 몇 칸 올라가 유채꽃을 바라보았다. 순간 멈췄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채꽃이 일제히 출렁출렁 거렸다. 마치 노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한참을 넋 놓고 바라봤다. 콕 박혀 신경 쓰였던 작은 가시 하나가 쏙 빠져 나간 것 같았다. 또 누군가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 것 같았다.
한적한 시골 강변, 노란 꽃파도, 동화나 소설 속에 나올법한 원두막... 순간 무엇인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며 시원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단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잠깐이나마 세상이 멈추었으면 하는 상상도 했다. 휴대폰에 찰칵찰칵 노란 유채꽃을 넘치도록 담았다. 휴대폰에서 유채꽃 향기가 날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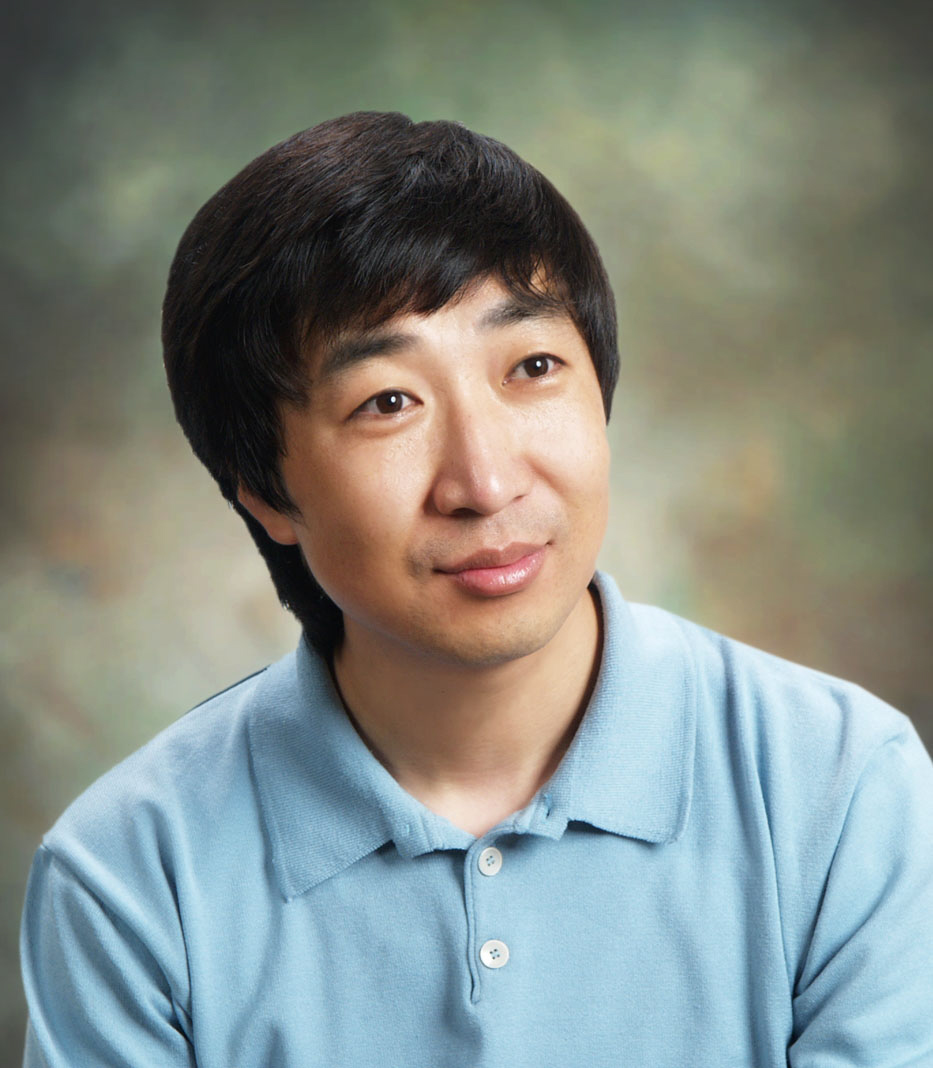
이젠 오랜 시간 끙끙거리던 노란 유채꽃 앓이는 오늘로써 끝이다. 대신 해마다 만날 유채꽃에 설렘 가득이다.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조금만 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노란 유채꽃.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운치 있는 유채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란 유채꽃 파도가 밀려와 내 발목을 잡아당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