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최종진 충주효성신협이사장·전 충주문인협회장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 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 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이생진님의 '설교하는 바다'는 오히려 고즈넉하다 못해 차라리 눈물겹다.
한 발자국 다가서면 다가 설수록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지는 사랑의 폭을 좁히지 못하던 김화백은 결국 이 인연없는 내륙의 작은 도시와 무관하고 싶다며 안개 자오록한 새벽에 서둘러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가 습관처럼 암송하던 '설교하는 바다'를 더 이상 들어볼 수 없게…. 뒤늦게 찾아간 화실에는 달랑 '나는 섬으로 간다'라는 낙서 하나만 쓸쓸히 붙어 있었다.
그는 가끔 '시인의 공원'에 들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섬 이야기를 문인들에게 좋은 글감이라며 신비스럽게 풀어놓곤 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해 묻는 걸 몹시 꺼려했던 그에게 사십대 후반의 아내와 피아노를 잘 치는 여덟 살배기 딸 하나가 있다는 것 외엔 더 이상 내력을 알 길이 없었다.
이곳에 와서 다섯 해가 넘도록 홀아비 생활을 하며 그가 기울였던 미술 작품에 대한 열정은 차라리 고행 그 자체였다. 심산유곡의 수도승처럼 한동안 작업실에 묻혀 몰두할 때는 며칠씩 제대로 먹고 마시기도 잊고 밤을 지새기도 일쑤였다. 그러다가도 구레나룻을 덥수룩히 기른 채 느닷없이 나타나 문인들과 어울려 담소할 땐 조금도 그가 섬에서 온 이방인이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는 철저했지만 남들에겐 깎듯했고 정이 많았다. 한번은 어느 초겨울 주말, 새벽에 뜬 방어회를 가져왔다며 지인 여나문을 우동집으로 초청하여 나눠 먹은 기억도 새롭다.
그랬던 그가 열병처럼 한 여인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얼핏 들렸다. 그러나 상대방 여인은 그 사실도 모르고 김화백 혼자 말 한 마디 건네지도 못하고 노상 자신을 힐책하며 지내고 있다 했다. 그러니까 지난 입춘 무렵 '무너져 내리는 가슴'이란 장시를 김화백이 가져와 내게 작품평을 해달라고 졸랐다.
시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그예 떠나시겠다는 말씀에/ 내 가슴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산 벚꽃이 눈발처럼 날리는 약수터 맞은 봉/ '해맞이 동산'벤치에 혼자 앉아/ 시름없이 떠가는 구름조각을 바라봅니다/ 산을 오르며 생각 없이 붙잡고 지나친 굴참나무도/ 이윽고 세월이 가면 표피가 반질거리고 윤이 나듯이/ 그댈 향한 내 소소한 바람도/ 어느덧 떨칠 수 없을만큼 더께 되어/ 고목처럼 버티고 선 오늘이 결코 우연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아주 가끔은/ 생각나는 사람으로…/ 비그을 아주 작고 초라한 원두막으로/
그렇게 남아 있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저 홍역을 치르듯 때가 지나면 아픔도 치유되려니 하는 생각에 무덤덤히 "김화백! 세월이 약이야 .아픔도, 슬픔도 지금은 건드리지마 그냥 지나가게 둬…" 그러나 그는 다시 피어나는 봄꽃을 바라 볼 용기기 없다며 아니 그 눈부심이 자기에겐 부끄럽다며 한사코 짐을 꾸려 떠나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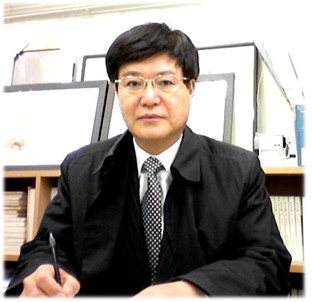
하긴 그를 만류할 살가운 이웃도 없었고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섬에 대한 신비를 우리는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는 어느 섬 고샅길에서 잊고 싶은 이 내륙의 도시를 떠올리며 밤을 지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피어났던 화사한 봄꽃은 어찌 보았으며 또 땡볕 더위를 어찌 견뎌냈는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고 귀뜨리 소리만 소나기 같이 들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