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년 넘게 살고 있다. 아파트에 살다가 마당이 있는 곳에 살고 싶었다. 당시 집을 구입할 형편이 아니었기에 한 2~3년 정도 집을 보러 다녔다.
시내에서 먼 외곽 시골까지. 지금도 기억나는 곳은 산꼭대기쯤 위치한 기와집이었다. 내가 원하는 마당에 나무가 있었지만 집이 너무 낡아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게다가 눈이라도 오면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어 보였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 4살이 된 큰아이는 마당이 있어 신기해했다. 우리는 작은 기와집을 없애고 더 작은 2층집을 지었다.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기로 했다. 공사하는 분이 벽 한 부분을 시멘트를 바르면 아이와 함께 곁에 붙어 있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빨리 우리들의 작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이와 나는 그동안 바닷가에서 주워 온 조개껍데기를 모은 큰 병과 통을 가져왔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벽을 보고 아이와 나는 눈빛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끄덕 신호를 보냈다.
말랑말랑한 시멘트벽에 조개껍데기를 예쁘게 붙이기 시작했다. 나비처럼 붙이기도 하고 꽃처럼 붙이기도 했다. 언젠가 아이가 길에서 주워 온 동글납작한 돌 몇 개도 붙였다. 돌 위로 선을 쭉 그어 꼬리까지 살짝 그려 음표를 만들었다. 크고 작은 돌을 붙이니 마치 악보가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런 모습을 본 공사하는 분은 처음에는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이와 웃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하나 붙이니 반짝이는 눈빛이 되었다. 멋진 벽이라며 엄지 척을 보내 주었다. 조개껍데기로 만든 꽃에 나비가 날아오는 모습, 또 조개껍데기 꽃에 나비가 앉아 쪽, 뽀뽀하는 모습 같았다. 돌 악보는 마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노래로 들려주는 것 같았다.
아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르르 나갔다 들어왔다. 주머니와 손에는 문구점에서 산 유리구슬이 있었다. 아이는 시멘트벽에 유리구슬을 해바라기처럼 동그랗게 콕콕 붙였다. 햇살이라도 들어오면 구슬이 더 영롱하게 반짝일 것만 같았다.
그러다 아이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다. 그러더니 제일 좋아하는 미니 자동차를 꺼냈다. 아이는 유리구슬 해바라기 옆에다 미니 자동차를 대고 꾸욱 눌렀다.
다음 단계는 마당으로 나갔다. 형편이 안 되어 담장 벽 또한 새로 할 수 없었다. 대신 하얀색 페인트를 듬성듬성 칠했다. 아이와 나는 아크릴물감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초록과 연두를 사용해 멋진 나무를 그렸다. 위쪽으로는 노란 달도 동그랗게 하나 그렸다. 아이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크레용으로 연신 선을 그어댔다.
자동차가 소풍을 가는 거란다. 사이좋게 가는 자동차들. 서로 붙어 있어 사고 나기 안성맞춤이다. 길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렸다. 소풍가는 자동차들이 행복해 보였다.
이사 온 후 7년 정도 있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둘째는 한 4살 때부터 종이에다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러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벽에다 그림을 붙여 달라고 했다.
아이는 5절지 스케치북 여러 장에 캐릭터 같은 것을 그렸다. 얼마나 큰지 아이 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렸다. 나는 그것을 테이프로 붙여 이어주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여름쯤,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하얀 벽에 직접 그림을 그렸다. 영어에 재미를 붙였는지 멋진 필기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글을 적고 장미를 그려 넣었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 장래희망이 패션 디자이너란다. 중학교 때는 자동차 다자이너를 얘기하더니 패션디자이너란다. 역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에 실제 옷보다 조금 더 크게 셔츠를 그렸다. 흑백으로 표현했는데 정말 못도 그려 멀리서 보면 옷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바람이라도 불면 훌러덩 떨어질 것처럼 아주 잘 표현했다. 그 후 둘째 아들은 우리 방 한쪽 벽면을 꾸며주고 싶단다. 그러더니 회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정 물감으로 글자를 써 주었다. 얼핏 보면 골목 카페 벽 같아 보인다.
살짝 그림에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정말 디자이너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 운동에 관심을 갖더니 지금은 헬스장을 차려 트레이너가 되고 싶단다. 조만간 벽에는 운동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다.
돈을 들이면 쓱쓱 빠르고 예쁜 벽지를 붙여줄 것이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꾸민 소박한 벽은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추억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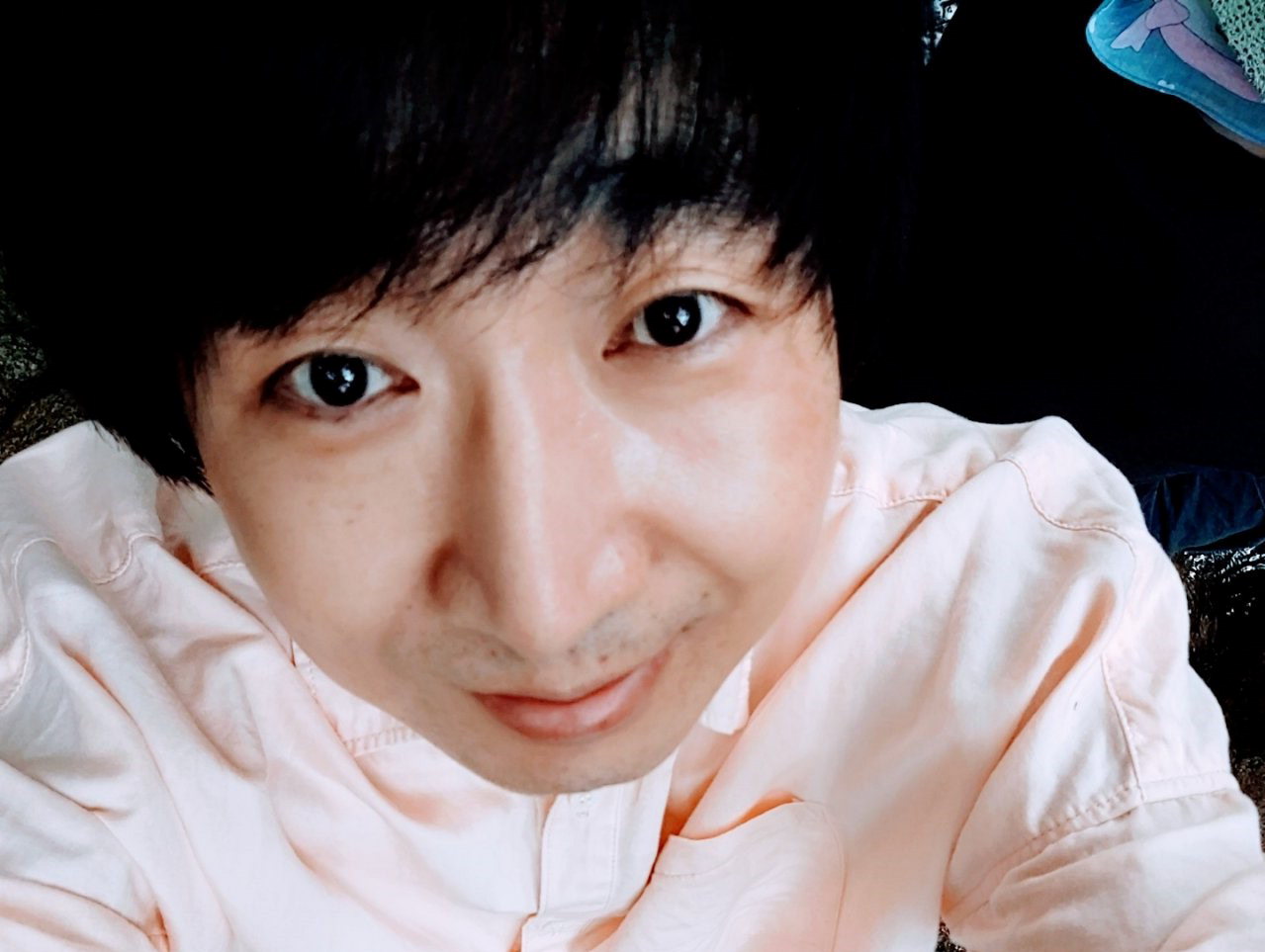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큰집과 화려한 장식을 생각한다. 하지만 언젠가 읽은 박현정 화가가 쓴 <작은 집 작은 살림>책 속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살림 이야기가 기억난다. 값비싼 장식품이 없어도 작은 공간에 나만의 취향을 담아 멋스럽게 꾸민 집. 작은 공간이라도 아이들이랑 함께 한다면 더 멋진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 변신한다.
앞으로 우리 집 벽을 두 아들이 어떻게 꾸밀지 은근히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