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한병선 교육평론가·문학박사
우리 역사상 공공성(公共性)이란 말이 요즘처럼 많이 회자된 때가 있었을까. 아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처음일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세뇌시킬 정도로 이 말이 등장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체를 위해서'란 말 앞에서는 모두 주눅이 들어 할 말을 잃는다. 공공성이 무슨 의미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꼼짝 못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일까.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현실에서는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집산주의(集産主義)는 공통점을 갖는다.' '정부는 공사화가 추진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의 사회성, 공공성, 국가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등과 같은 예로 사용한다.
공공성의 문제는 이런 사례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예컨대 내가 혼자 부르는 유행가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떨까. 연구자들이 쓴 논문을 참고할 때 무료로 오픈 엑세스(open access)를 할 수 없다면 어떨까. 같은 논문이라도 특허권이 있는 경우라면 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오픈 액세스에 무게를 두고 논문의 무상공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작권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무상공개를 반대한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그렇다 치자.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공공성의 문제는 어떨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공공성이란 이름의 '공공성 과잉' 특히 '과시적 공공성'의 문제다. 과시적 공공성은 국민의 특정한 위임으로서의 대표 개념이 아닌 민중 앞에 과시하는 공공성. 즉 중세의 봉건체제에서와 같은 공공성을 말한다. 신적(God-like)이거나 고귀한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로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다.
국가나 권력이 과시적 공공성으로 흐르게 되면 권력은 선(善)이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곧 악(惡)이 된다. 개인의 판단과 자율은 완전히 거세되고 심지어 죄책감마저 들게 한다. 현재 국민을 우민 취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역정책이 한 부분 '과시적 공공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국민을 겁박하듯 일벌백계(一罰百戒)와 무관용을 강조하는 방역 브리핑은 온통 집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란 말로만 들린다. 개인의 인권과 사정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사(私)'를 버리는 것이 '공(公)'이며, 공권력과 의료 전문가들만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주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다. 서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되고 개인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한 개인은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되고 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누가 되었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새로운 '어젠다'가 공공성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만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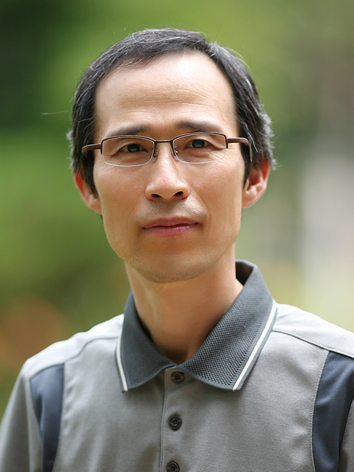
그럼에도 지금의 모습은 전염의 위험이라는 위험요소만 강조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제적 영업금지, 방역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 등, 국민 친화적 방역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국민들에 대한 '단체기합'이란 말을 넘어 '방역독재', '방역 파시즘'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