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한병선 교육평론가·문학박사
우리 사회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해 서로 정쟁을 벌이는 모습들이다. 이뿐이랴, 퇴임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알박기(Burrowing)' 인사 역시 낯설지 않다. 명분은 임기 중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 선지 반년이 지난 현재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퇴진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정쟁 중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문제를 놓고 벌이는 충돌은 대표적이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과 이를 측면 지원하는 감사원의 전방위 압력은 점입가경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런 희망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한 경우는 없다. 해법은 없을까.
'엽관제(The Spoils System)'가 답이다. 엽관제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다. 엽관(獵官), 즉 사냥한 관직이란 의미가 함의하듯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하는 보상적 방식이다. 정권 창출의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임명한다. 근대 민주주의 초기 미국에서 워싱턴 대통령이 시작한 제도지만 1829년 잭슨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일괄 교체하는 방식으로 신구권력 이동 간의 갈등을 막는다.
무엇보다 책임정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민주정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엽관제를 통해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도 있다. 무능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임명됨으로서 업무 수행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정권교체 때마다 발생하는 소모적 정쟁을 막을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들도 부분적으로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정무직 공직자들의 퇴진 문제를 놓고 정쟁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장관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지"라는 한 여당 의원의 발언까지 나왔다. 모든 역대 정권들이 예외없이 이런 갈등을 겪었다. 이념을 비슷하게 공유하는 정당에서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엽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권력구조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엽관제는 현실적으로 일반 직업공무원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엽관주의를 실시한다고 해서 직업공무원들의 임용시스템이 훼손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거의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미 한 부분 엽관제가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내각의 장관들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비서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엽관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퇴임할 때 같이 퇴임한다. 이런 엽관제를 제도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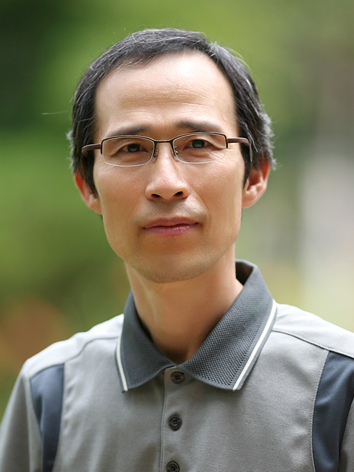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더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7,천~18,천여 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규정해 놓은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처럼 구체화해야 한다. 더하여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민도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직 공무원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항상 매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되었다. 엽관제 단점 중의 하나인 전문성의 결여나 부정부패 소지의 문제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