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장병갑 사회부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50여 일도 남지 않았다. 정당별 '옥석 고르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피 말리는 당내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면서 정당에서 실시하는 여론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며 하루가 멀다 않고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른 아침 출근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각종 행사장을 다니며 늦은 밤까지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 기간으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 그러나 당내 경선 후 본선행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총력전을 펼치며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 전쟁의 최전방에서 자당 후보들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원들이 총선에 출마한 자당 후보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신었던 '운동화'를 다시 꺼내 들고 끈을 동여매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어느 예비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지 출마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행사에 지방의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세몰이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자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자칫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중도 낙마하면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가 뚜렷하지 않은 선거구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결국 지방의원들은 보험용 눈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 A예비후보자 행사에 참여한 뒤 바로 이어지는 B예비후보자 행사로 분주하게 발길을 돌린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기인한다. 지방의원들을 정당이란 조직 속에 묶는 정당공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첫 지방선거는 1공화국 때인 1952년 시행됐지만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없어졌다가 1991년에 재도입됐다. 당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특히 시·군·자치구의회의원(기초의원)의 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2006년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부터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이뤄지고 유급제로 바뀌었다. 중앙 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당이 지방의원들과 책임을 함께해 지방의회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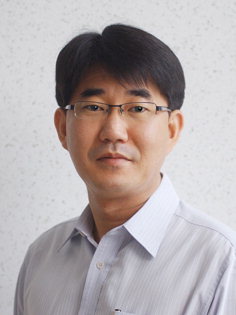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주요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의 지름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의원 또는 당협·지역위원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의 당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활동했는지가 공천받는 지렛대가 된다. 지역을 위한 일꾼임에도 지역 주민들보다는 정당이나 지역구 의원, 당협·지역위원장 입맛에 맞아야 하는 구조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면 지방의원 의정활동이 멈춘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지속되는 구조 속에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당협·지역위원장과는 종속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요구다. 지방선거가 재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사람이 30살이 되면 뜻을 세우는 나이, 즉 입지(立志)라고 한다. 이제 정당이나 중앙 정치에 얽매이기보다 지역분권에 따른 자율화를 높일 때다. 지방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