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진정한 문리의 통합이 문과 이를 아우르는 사유방식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형이상학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문과 이를 결합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나 역사학자 등도 모두 과학적 사유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글을 쓰고 비평합니다. 자연과학자의 사유와 철학자의 사유에는 추호의 차이도 없습니다. 물론 서로가 지니고 있는 신념의 토대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적 사유는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각기 다른 신념이 대화를 막는 방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발상을 이뤘던 이들의 지적 호기심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그들의 지적 탐구가 文과 理의 영역을 아울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융합이 일종의 도약을 위한 교육, 즉 창의적 교육과 함께 언급되는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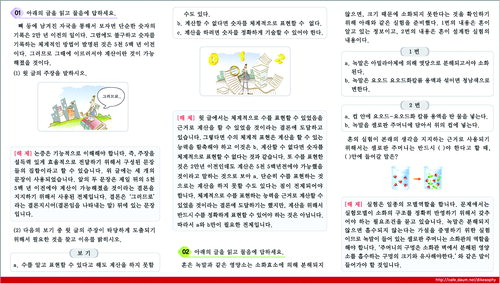 |
||
송창희 기자
333chang@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