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가끔 밖에서 점심을 먹고 누군가를 바로 만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양치질이 여의치 않아 대충 물로 입을 헹구게 된다. 잠깐 껌이라도 씹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껌과 멀어지게 됐다. 대신 아주 가끔 아이들이 주는 풍선껌을 쫙쫙 씹어 푸~ 하고 풍선을 불곤 한다. 그러면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요즘 풍선껌 종이는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가 있어 버리지 않고 책갈피로 사용한다. 예전엔 껌종이를 모은 적도 있었다. 미술시간 모자이크할 때 색종이 대신 껌종이로 하면 훨씬 예쁘고 매력적인 작품이 나왔다. 여름방학 숙제로 아이들은 옷감이나 상표 모으기를 할 때 껌종이 모으기를 몇 번 했었다. 숙제를 할 때면 그 핑계로 새로 나온 껌을 사곤 했다.
그렇게 산 껌들은 아껴 씹었다. 단물이 빠지고도 한참을 씹다가 장롱 옆이나 달력 위,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벽에 붙여 놓았다. 식구들이 많은 집은 연필이나 볼펜으로 껌마다 각자의 것을 표시했다. 그래선지 장롱 옆면은 떼어낸 껌 자국들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껌 자국이 없을 것 같은 여자 친구를 알게 되었다. 같은 반인 그 친구가 껌을 씹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 친구는 좀 살만한 집 아이였다. 당시 귀한 피아노도 있고, 잘 먹어선지 덩치도 또래들보다 컸다. 쉬는 시간 그 친구는 껌을 씹기 시작했다. 껌 한 통을 모두 까서 입안에 넣고 힘들게 껌을 씹었다. 그러다 단물이 빠지면 미련 없이 뱉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입이 아프도록 씹어도 행복할 만한 양이었다. 그 친구의 껌 씹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그 껌 이름이 또렷하다. 바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껌이었다. 그 충격(?)때문이었을까. 아이스크림 하면 껌이 먼저 생각난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껌이 사과껌이다.
특히 사과 껌의 연두색 사과 그림만 보면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냥 기분이 좋았고 어떤 설렘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선지 학창시절 그림을 그릴 때 연둣빛 사과 서너 알을 정물대에 배치하곤 했다. 지금도 사과껌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신문을 보다가 껌에 대한 색다른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껌을 씹으면서 걸으면 운동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다. 껌을 씹는 행위가 생리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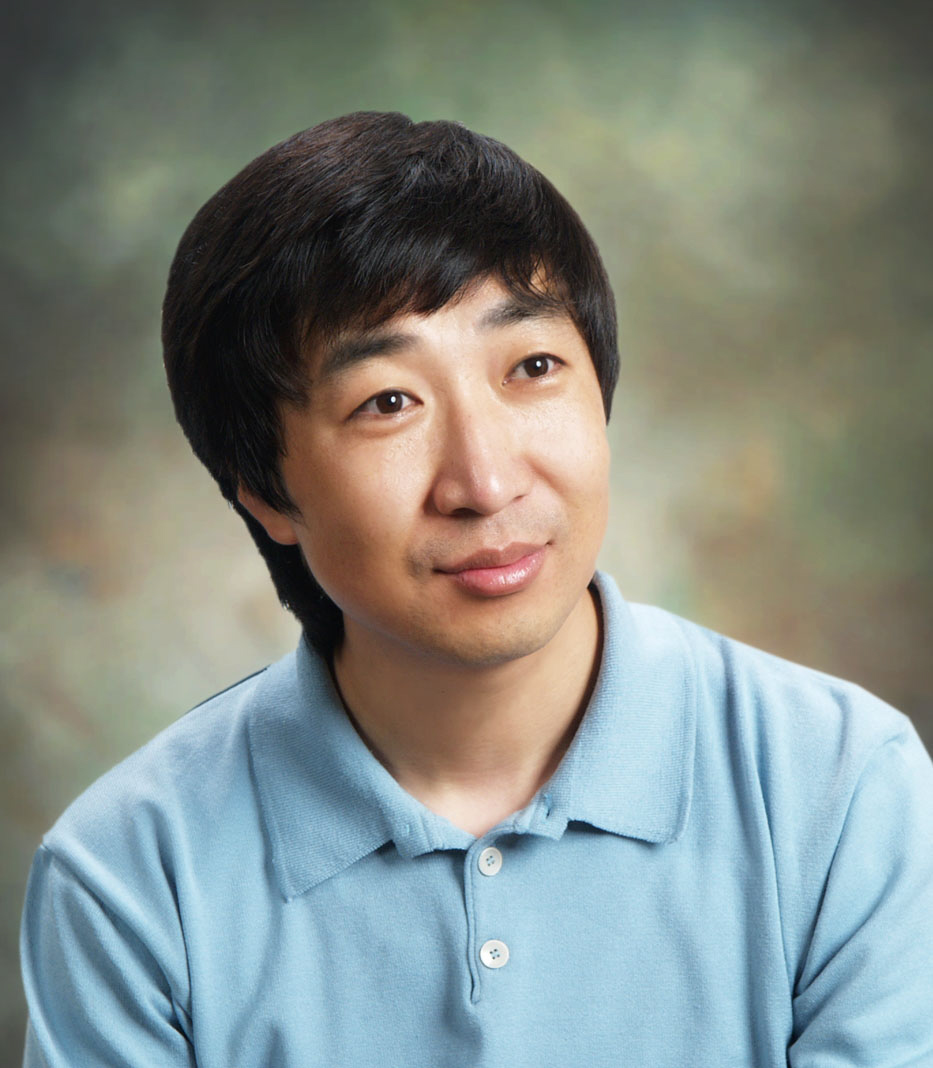
운동할 때 리듬감이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등 운동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아마도 껌을 씹는 것도 리듬감이 느껴지는 행위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껌 하면 조심할 게 하나 있다. 껌을 씹다가 잠이 드는 경우다. 아침에 일어나면 털커덕 머리카락에 붙어 '경구'가 아닌 '영구'로 살아야했다. 우린 그런 많은 영구들을 깔깔대며 놀려먹곤 했다. 껌 하나에 행복한 시절이었다. 지금은 뭐든지 흔하지만 껌만큼 흔한 것도 없을 듯싶다. 일상에 지쳐 조금은 우울한 날 껌 하나 씹어 볼까 한다. 껌을 씹는 동안 보이지 않게 쌓인 욕심이 단물과 함께 빠져나가지 않을까. 풍선껌이라면 후~ 엄청 큰 풍선을 불고 싶다. 내 몸이 둥둥 하늘로 떠오를 수 있는 엄청 큰 풍선이면 더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