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맞는 것과 병원 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학교에서 주사를 맞을 때면 전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자고 꽁꽁 언 얼음이 되었다. 아침에 밥도 목구멍에 넘어 가지 않았다. 그러니 주사를 맞을 때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주사를 맞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슬쩍 뒷걸음질을 쳤다. 그래도 내 차례가 찾아왔다. 알코올 솜을 문지르고 주사바늘을 쿡, 찌르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흐물흐물 푹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이런 난 지금도 겁이 많은 편이다. 무서운 영화도 질끈 눈을 감으며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겁이 많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치과 장면만 봐도 내 이가 아파오는 것 같다. 내시경에 관한 글과 사진만 봐도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쓴다.
또한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건강관련 코너를 보면 꼭 내 증상 같다. 그래서 보는 내내 은근 신경이 쓰인다. 한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곤 하다가 어느 날 그 증상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발에 돌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달팽이 걸음으로 병원에 간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향하게 되었다. 바로 병원 선생님의 따듯한 눈빛과 말 때문이다.
두 선생님이 계신데 한 분은 정연무 선생님이시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한참 마주하다 보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차분차분한 말과 따듯한 눈빛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게 분명하다.
특히 큰 걱정을 하는 내게 며칠 약 잘 먹으면 곧 괜찮아 질 거라고 편안하게 말해 주신다. 한번은 감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며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단다. 후! 얼마나 좋던지.
두 번째는 치과의 공포증을 날려준 선생님이다. 정태형 선생님이다. 난 치과가 제일 신경이 쓰인다. 어릴 적에 담임선생님이 이 닦기를 대충하는 우리들에게 소금과 칫솔을 가져오라고 했다. 우리들은 수돗가에 빙 둘러앉아 단체로 이를 닦았다. 그런 날은 거울 속 내 이가 하얀 눈보다 하얀 아카시아 꽃보다 더 하얘보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를 따라 간 치과는 정식 치과가 아닌 듯 했다. 어두컴컴한 좁은 골목을 한참 지나 들어간 치과는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오싹오싹했다. 훗날 난 그 치과 이름을 '삐그덕 치과'라고 지었다. 지금도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계단은 나무계단으로 '삐그덕 00', '삐그덕 000' 라고 나름 삐그덕 시리즈를 만들곤 한다.
이런 내가 정태형 치과 선생님 덕에 "아~"하고, 입도 잘 벌린다. 치료 전에 늘 긴장을 풀어주는 따듯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선생님의 손길이 내 이에 가면 마음이 푹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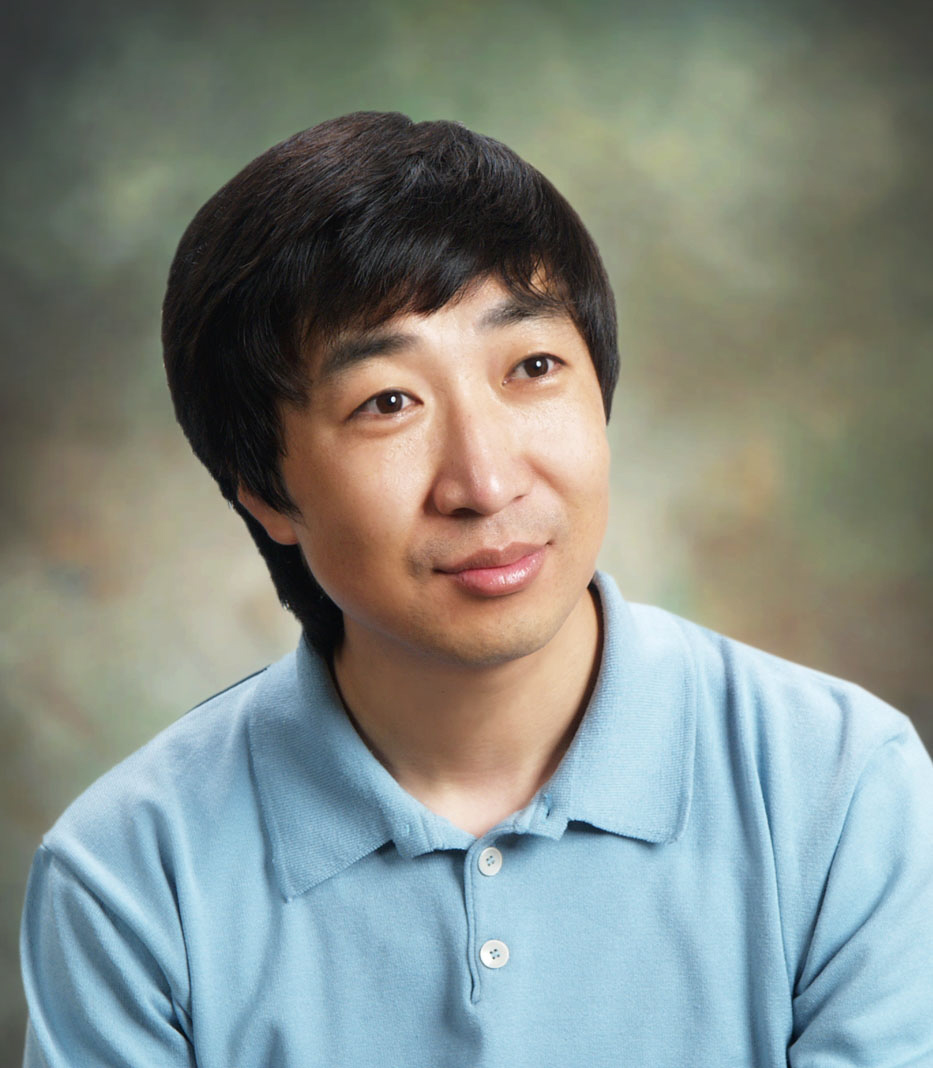
그리고 이 관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 주는 걸 잊지 않는다. 연세가 많은 데도 꼭 존중해 준다. 곁눈질로 슬쩍 보면 젊은 사람한테도 그런다. 언제나 한결 같다.
내가 이런 두 선생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축복 받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런 따듯함과 친절 덕분에 아픔이 다 나은 듯하다. 그리고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듯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먹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