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둘째 아들은 잠들기 전 꼭 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다.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얼마 전까지. 그건 순전히 아내와 나 그리고 첫째 아들 때문이다. 우리 셋의 공통점은 키가 작다는 것이다. 둘째 아들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을 비교하니 은근 키 걱정이 되었나 보다. 그날부터 둘째 아들의 '190㎝'란 기도가 시작되었다.
둘째 아들은 190㎝가 얼마큼 큰지 잘 몰랐다. 아내가 190㎝이면 엄청 크고 농구선수도 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걸 기억해 두었다가 190이란 숫자를 마음에 담았다 보다.
우리 집 유전자에 190은 커녕 180도 어림없다고 얘기라도 하면 둘째 아들은 키 크기에 좋다며 우유도 잘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어느 날엔가 잠을 푹 자야 키가 큰다며 오래 자기도 했다. 잠이 많아도 너무 많은 나를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그런 둘째 아들은 명절에 친척이 모이면 또 다시 키 작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기도는 더 절실해 졌다. 뭐를 해도 190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3 까지 거의 제일 작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했다. 난 1번은 아니었지만 7번 이상을 벗어 난적이 없었다. 어떤 공부 잘하던 친구는 일부러 눈이 안 좋다고 맨 앞자리로 앉는 경우가 있었다. 난 정말 맨 앞줄을 벗어나고 싶었다. 정말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둘째 줄이라도 앉고 싶었다. 하지만 맨 앞줄은 늘 맡아 놓은 내 자리였다.
중학교 교복을 맞출 때였다. 3년 동안 더 클 줄 알고 넉넉히 맞추었지만 내내 헐렁했다. 게다가 같은 동네 친한 친구랑 등하굣길을 함께 했는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또래 학년에서 제일 키가 컸다. 하굣길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 어찌어찌해서 구한 우산 하나로 둘이 간 적이 있다. 물론 내가 작으니 그 친구가 우산 손잡이를 잡았다. 난 팔도 안 아프고 좋았다. 하지만 그 친구는 좀 팔이 아팠을 것이다. 교복에 학년 배지를 달아서 우리 둘이 가면 친구가 맞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더러는 웃기도 했다.
둘째 아들의 키 크기 절실함이 통했는지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또래들 중에 그렇게 작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가족의 응원이 시작되었다. 다만 은근 질투가 났는지 첫째 아들은 자기도 그땐 그러다 키가 멈췄다며 찬물을 슬쩍 끼얹었다.
하지만 찬물도 소용없었다. 정말로 둘째 아들의 키는 쑥쑥 자랐다. 집 한쪽 기둥에 키를 재고 선을 그어 놓았다. 그 옆에 날짜와 함께. 드디어 아내 키를 넘어서고 내 키를 넘어섰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가족 중에 그나마 키가 큰 첫째 아들의 키를 넘어섰다. 우리는 신기했다. 둘째 아들은 지난 설날에 모였을 때 제일 키가 컸다.
다들 둘째 아들에게 키에 대해 한 마디씩 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둔 친척들은 자신의 아이들도 키가 클 수 있단 희망을 갖는 눈치였다. 둘째 아들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한다. 얼굴이 작아서 말라보이지만 옷을 벗으면 또래에 비해 죽여주는 몸매다. 근육도 멋지다. 그런 둘 째 아들을 아내와 난 모델처럼 서게 해서 찰칵찰칵 휴대폰에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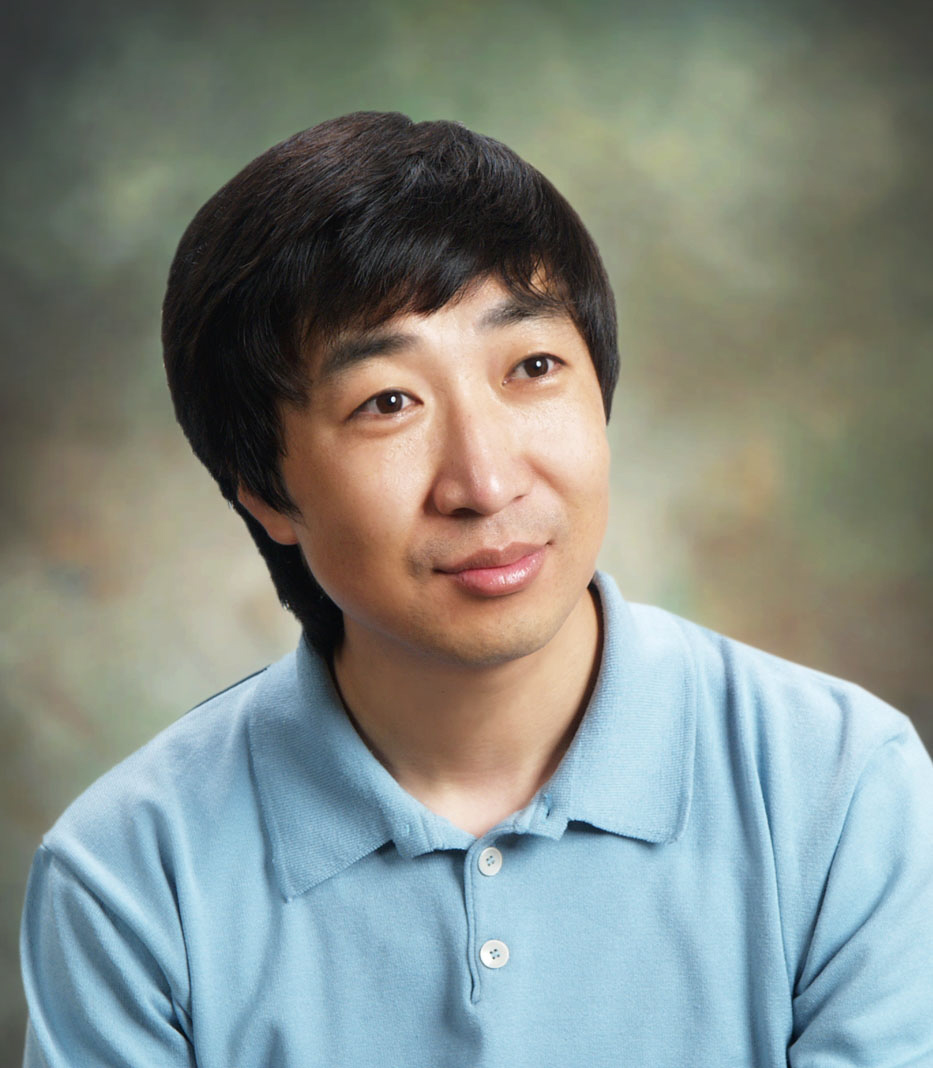
그런데 요즘 둘째 아들의 190 기도가 살짝 흔들리고 있다. 이제 190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190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눈치다. 아내와 난 한결 같은 오랜 기도를 꼭 들어줄 거니까 190은 될 거라 부추긴다. 그럼 둘째 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만 더 컸으면 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내가 보기엔 이젠 다 큰 거 같다. 커봐야 요즘 보통 키에 해당 될 것 같다. 우리 가족에겐 보통은 아주 큰 키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아주아주 혹시나 190㎝ 되면 어쩌나,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