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우리 집 골목길에 빈집이 한 채 있다. 점점 지붕이 내려앉는 것 같다.
그래서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밤이면 좀 무섭기도 했다. 그 빈집을 보며 어릴 적 옆집이 생각났다. 옆집은 다른 집이랑 다르게 마루에 미닫이문이 있었다. 우리 집 마루는 비가 심하게 오면 마루까지 비가 들이쳤고 눈보라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더 옆집이 부러웠다.
딱 빈집이 그런 문이었다. 오가며 '한때 저 집에도 사람의 온기가 넘쳤겠지, 와글와글 저녁상에 모여 밥을 먹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이 사라지고 집터에 옥수수를 심었는지 점점 키가 자랐다.
옥수수를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푸릇푸릇 커가는 옥수숫대를 참 좋아한다. 점점 진초록으로 바뀌는 옥수숫대 사이로 붉은 수염이 나오면 참 운치있다.
특히 바람이라도 불면 옥수숫대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옥수수밭 풍경을 본 일이 별로 없다.
몇 년 전인가 자주가는 길가 옆으로 옥수수밭이 생겼다. 그 옆을 지날 때면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얼마나 그 풍경이 좋았는지 매번 지날 때면 털이 오소소 솟고 작은 전율이 왔다.
옥수수밭 진초록이 마치 플라타너스 가로수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그 이후 옥수수밭을 볼 일이 없었는데 우리 동네 빈 집 터에 하루가 다르게 쑥쑥 키가 자라고 있으니 요즘 내 눈이 호강을 한다.
어릴 적 찐 옥수수를 많이 먹었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저녁 먹고 한참 있다가 가마솥에 찐 쫀득하고 달콤한 옥수수를 멍석에 앉아 먹었다. 한 알 한 알 똑똑 떼어 내어 먹기도 하고 도로록 도도록 길을 내어 다람쥐처럼 먹기도 했다.
먹고 난 빈 옥수수통은 버리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잘 말려 긴 막대기를 꽂아주었다. 손이 닿지 않는 등이 가려울 때 그것으로 쓱쓱 긁으면 아주 시원했다.
옥수숫대 역시 마디마디 잘라 잘 씹으면 단물이 나온다. 껌처럼 질겅질겅 씹다가 뱉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찐 옥수수 알을 모두 떼어 내어 냉동실에 둔다. 그리고 저녁에 출출하다 싶으면 버터에 볶아서 소금을 솔솔 뿌려 먹는다. 숟가락으로 퍼 먹으니 책을 읽으면서, 또는 커피와 함께 먹어도 좋다.
옥수수수염으로 요즘은 차를 우려 마신다고 한다. 하지만 난 붉게 나온 옥수수수염이 꼭 사람머리처럼 보였다. 그래서 옥수수밭을 돌아다니면 길게 나온 붉은 수염을 찾아 머리처럼 따주었다. 초등학생 때 만들기 숙제로 여름 미용실이라고 해서 빈 달걀껍질에 이 붉은 수염으로 딴 머리를 붙이기도 했다.
요즘 옥수수 철인지 길을 가다보면 옥수수를 판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옥수수. 이런 옥수수가 예전에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야 어쩔 수 없이 먹는 형편없는 작물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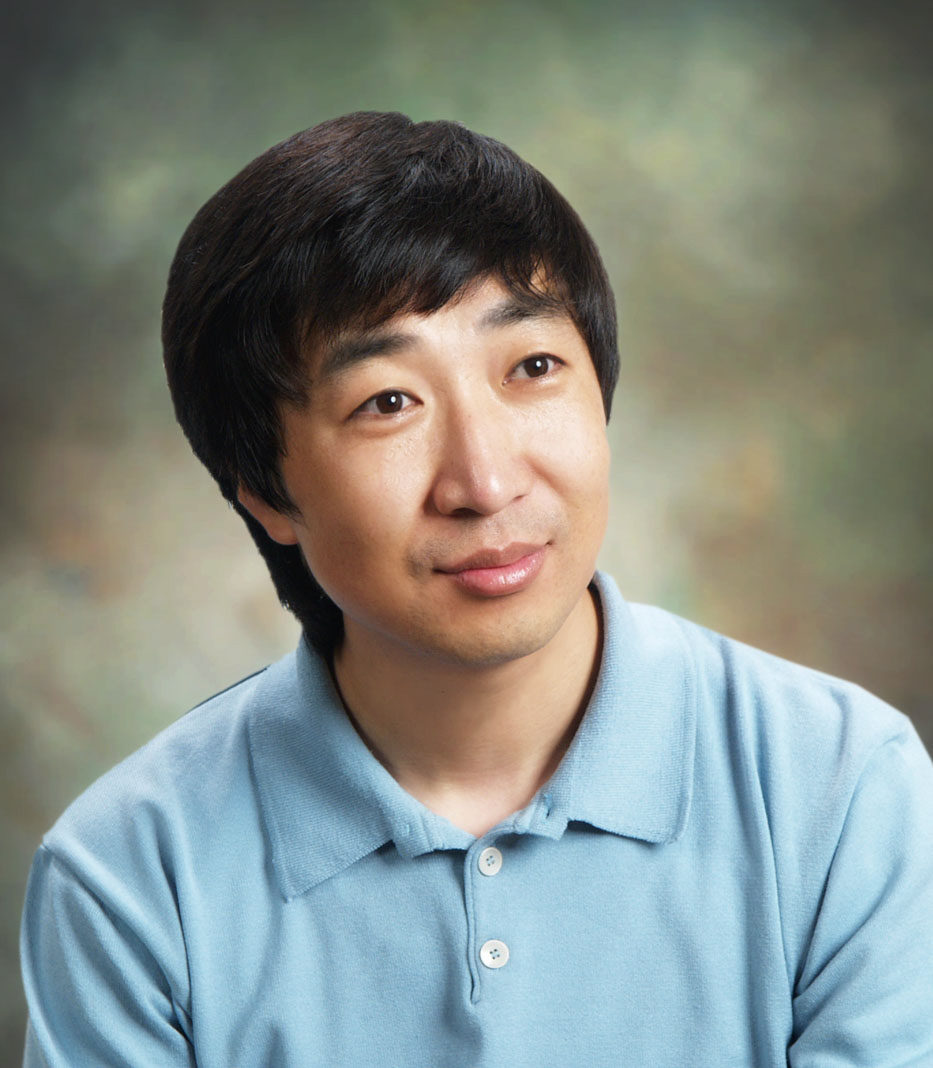
심지어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단다.
몇 번 옥수수밥을 해먹었다. 하얀 밥에 연노랗게 박혀 있는 옥수수 알이 연한별처럼 반짝였다.
구수하면서도 맛있는 옥수수밥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소리까지 맛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옥수수밭도 실컷 보고 옥수수도 많이 먹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