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카페를 가면 의자가 정말 다양하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의 커피 잔에 관심이 갔지만 지금은 의자에 눈길이 머물곤 한다.
요즘 의자는 보기도 좋고 앉아도 편안하다. 내가 의자 속에 폭 묻히는 기분이 들 때도 종종 있다. 가을비 내리는 날 차 한 잔 마주하며 의자에 기대어 책을 읽을 때면 더 없이 좋다.
우리 집에도 많은 의자가 있다. 노란색의 작은 의자는 미술 교습소를 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면서 밖에 내 놓았다. 필요하면 가져가래서 몇 개 가져왔다. 작지만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나 화분을 올려놓을 때 요긴하게 쓰고 있다. 의외로 튼튼해서 오래 사용 중이다. 무엇을 엎지르거나 얼룩이 묻어도 물걸레로 쓱쓱 닦으면 그만이다.
또 집에 꼬마 친구들의 방문이 있을 때 노란 병아리처럼 조르르 줄맞춰 놓으면 참 좋아한다.
예전에는 왜 그런지 식탁과 책상의 의자도 꼭 한 세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각각 개성을 살린 의자들이 보기도 좋고 질리지도 않는다.
언젠가는 세트로 구입해 하나가 망가지면 낭패였다. 하지만 요즘은 양말도 신발도 다른 색으로 신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색하지 않다.
가끔씩 작은 길이나 골목을 지나다 보면 한쪽에 의자가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부채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가 앉아 과자를 먹기도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양손 가득 들고 오다가 쉬고 가기도 한다. 낡은 의자지만 모두들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여름 그늘이 지는 나무 아래 의자는 더 없이 좋다. 1인용 의자가 있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긴 의자를 만나기도 한다. 두세 명이 앉아도 넉넉한 의자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내려 앉아 운치를 더 한다.
이런 의자를 볼 때면 문득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가 떠오른다. 책상도 의자도 짝꿍과 함께 사용했다. 둘이 한 마음이 되면 더 편안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책상과 의자에 줄을 긋곤 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칼로 금을 그었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 책상과 의자는 줄줄이 물려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도 맞는 짝꿍을 만났을 때는 착 붙어 앉았다. 가끔 아끼는 물건을 짝꿍 책상 속에 몰래 넣어 놓고 설렘이 가득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온통 해바라기가 줄 선 풍경을 담은 사진을 봤다. 해바라기를 보면 꼭 반 고흐가 떠오르고, 그림 중 '아를의 반 고흐의 방'또한 떠오른다. 왜 그런지 이 그림 속 의자를 보면 좀 쓸쓸해 보인다.
그림 속 의자 두 개는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반 고흐의 마음이 담긴 것 같기도 하다. 노란빛의 따듯한 의자가 나는 더 슬퍼 보인다. 만약 반 고흐가 더 오래 살았다면 의자에 앉아 그림이야기와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꼭 의자가 의자만은 아닌 듯싶다. 어릴 적 등을 기대고 앉았던 부모님 품도 더 없이 편안하고 따듯한 의자가 되어주었다. 부모님이 뒤에서 앞으로 꼭 안아주면 더 든든한 의자가 되어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었고 가끔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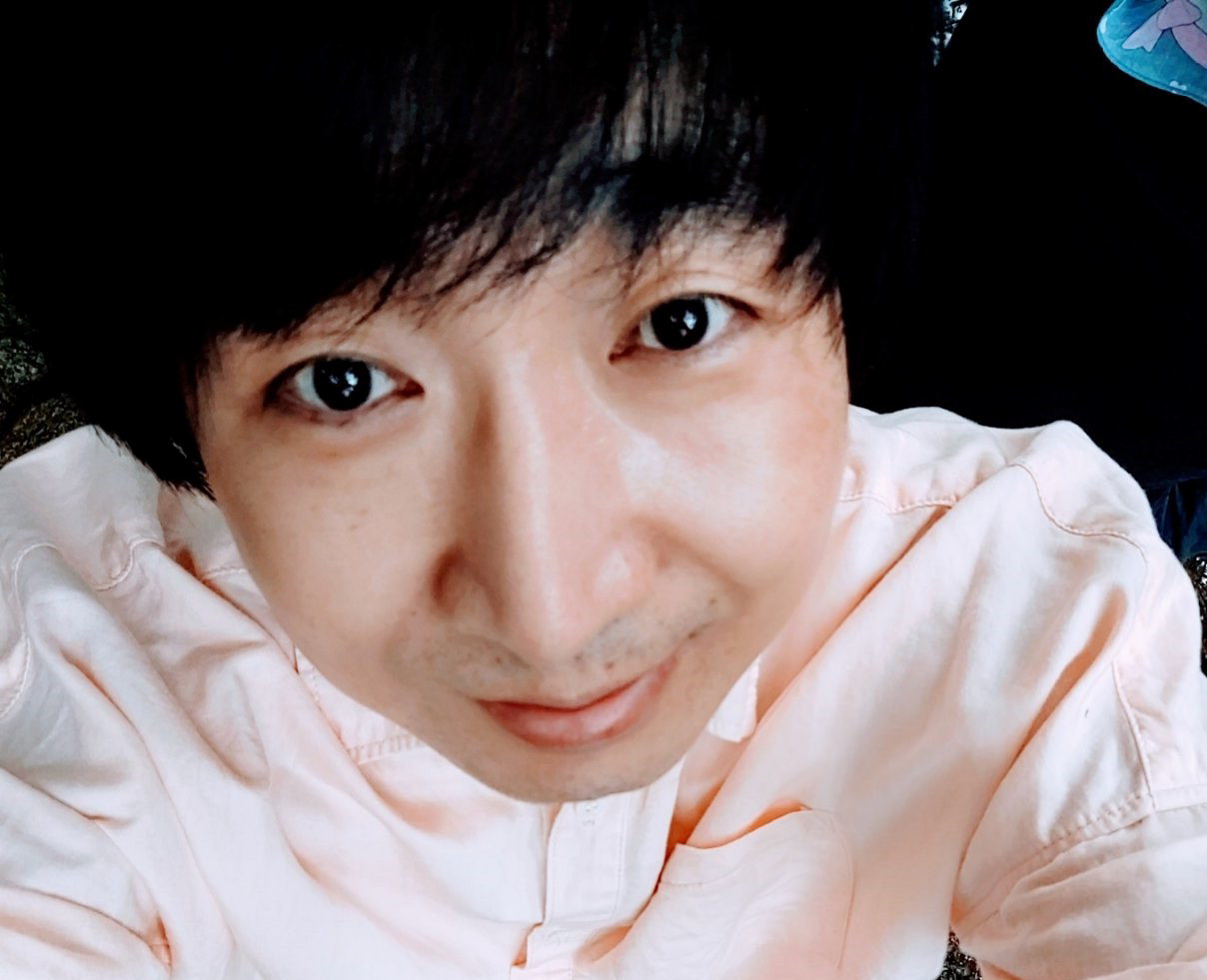
겉으로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들춰보면 다들 한 가지 정도는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
점점 짙어가는 가을, 조금은 쌀쌀하다. 이럴 때 누군가의 쉼표 같은 의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걱정대신 따듯한 온기를 채워준다면 더없는 위로가 될 것이다.

